제23화 : 상답
내가 우리 전라도 사투리를 정리할 때 ‘보꾹’이란 단어를 우리 고향의 사투리라고 하면서 ‘방의 부엌 쪽의 벽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어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장. 우리 집에서는 이불이나 책,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를 넣어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다.’라고 풀이한바 있는데, 우리 고향 사투리의 대가이신 자미원님께서 이 ‘보꾹’이란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이상하다, 우리 마을에서만 사용했는가?’하고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말을 나름대로 최종 정리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을 다시 한 번 정독하던 중 이 ‘보꾹’이란 단어를 「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라본 반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양상(梁上), 천장(天障)이 같은 말이다.」이라고 풀이된 것을 발견하고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환생하신 것 같은 반가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단어(말)도 태어나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아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자주 사용했던(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그 단어가 버젓이 국어대사전에 표준말로 등재되어 있으니 말이다. 비록 그 뜻을 정확히는 모르고 사용하였으나 가만히 살펴보면 의미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하고 자위하면서.
그런데 또 반자는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이라고 반자를 풀이하고 있는데, 에고 어렵다 어려워!
어쨌든 이 보꾹은 내게 추억이 많은 곳이다.
가난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보꾹엔 엄마가 장롱에 넣지 못한 여러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호기심에 이 함도 열어보고 저 함도 열어보곤 하였는데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옷감(곰팡이 냄새 비슷하면서도 싫지 않은 냄새가 나며 알록달록한)들 뿐이다. 이 옷감들을 순 우리말로 상답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는데 아마 엄마는 딸들을 시집보낼 때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계셨나 보다.
또한 그 좁은 공간은 우리들의 놀이인 숨바꼭질의 숨는 장소로도 이용되었으며, 나의 비밀스런 물건을 숨기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구슬치기로 딴 구슬도 거기에 두었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연도 거기에 보관되었다.
이렇게 어린 추억이 담긴 그 보꾹이 있는 우리 집은 헐어져 없어졌지만, 이 보꾹이란 단어가 살아 있는 한 언제든지 내 마음은 그 곳을 향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이 보꾹과 관련하여 ‘더그매’(=지붕과 천장 사이의 빈 공간)란 우리말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다.
상답 - 자식들의 혼인에 쓰거나 훗날에 쓰기 위하여 준비하여 두는 옷감.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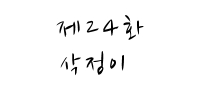 제24화 : 삭정이
제24화 : 삭정이
 제22화 : 사름
제22화 : 사름

















2012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새삼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예보대로 눈이 오려는지 하늘이 흐리다.
아니 눈발이 하나씩 날리고 있다.
춥지나 말아야할 터인데
내일과 모레는 더욱 춥다고 하니 괜히 움츠려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