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화 : 이춤
11월 초인데도 바깥 기온이 25도를 넘나드는 이상기온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절의 전령사인 창밖의 은행나무는 차츰차츰 노란 옷을 벗어가고 있다.
저 잎이 다 지고 나면 가지만 앙상한 은행나무는 겨울을 재촉할 터인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은행나무는 그 노란 은행잎으로 사춘기에 들어선 소녀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였으며, 이제 막 연애에 눈뜬 청춘남녀들의 연심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2억 7천만 년 전 고생대에 출현해 중생대에 세계적으로 번성하여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는 은행나무는 그 화석이 우리나라의 중생대 지층에서 다수 발견되었는데 특히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신생대 제3기 지층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화석기록이 없어 우리나라 자생종은 멸종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가로수 등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은행나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한다.
각설하고,
내가 첫 직장으로 근무한 곳은 고흥군수협 금진지소였다. 1975년 11월부터
1976년 4월까지 6개월(?)간 임시직으로 당시 우리 금산에서는 해태생산이 주 수입원이었는바, 그 수탁판매업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였다.
내가 근무하던 한 겨울에 수협에서는 근무복(점퍼와 모자)을 하나씩 지원해 주었다. 그 근무복을 입고 몇몇이 찍은 사진이 36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사진첩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그 때 같이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발령받고 이제는 퇴사한 연소의 김◯◯ 형님과 신금의 김◯◯ 동생과는 요즘도 만나면 그 옷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다)
왜 그리 두꺼운지!
요즘이야 과학의 발달로 가볍고 얇으면서도 따뜻한 기능성 옷이 대세이지만 그 시절에는 옷에다가 솜이나 스펀지를 넣어서 보온을 했으니 옷이 따뜻하려면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시절의 옷이 다 그러했으니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옷을 입으면 마치 상체만 발달하고 하체는 빈약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도 그 옷은 겨울바람을 쌩쌩 맞으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우리에게 추위를 막아주는 장한 옷이자 수협직원이라는 표식이었다.
요즈음에는 거의 볼 수 없어 그 발견만으로도 기사화되는 ‘이’라는 기생충이 그 당시의 겨울에는 사람들 몸에서 아주 호사를 누렸었다. 목욕을 자주 할 수 없는데다가 하나의 방에서 여러 사람이 기거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내 몸에 이가 많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어서 모두들 숨기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놈의 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몸을 물면서 피를 빨아 먹었는데 이가 물때의 그 가려움이란 상상을 초월하였다. 다행이 이가 무는 곳이 자기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 직접 긁어 가려움을 해소하는데 집이 아닌 사무실 등에서 자기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을 이가 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든 혼자서 가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몸을 으쓱거리기도 하고 소나 말 등 동물이 가려운 데를 나무에 비벼대듯이 가려운 곳을 의자나 벽에 대고 비벼대기도 했지만 그 가려움은 시원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거나 물건을 몸에 지녀 가려운 데를 긁지 못하고 몸을 일기죽거리며 어깨를 으쓱거리는 짓.」을 뜻하는 ‘이춤’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그 때 그 시절의 생활상을 추억하며 이 글을 썼다.
한편 「말이나 소가 가려운 곳을 긁느라고 다른 물건에 몸을 대고 비비는 짓.」은 ‘비게질’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등이 가려울 때 긁어주는 엄마의 거친 손은 왜 그리 따뜻하고 가려웠던 등은 왜 그리 시원했던고!
이제는 내 등을 따듯하고 시원하게 긁어줄 엄마도 저 세상으로 가셨으니 내 몸이 불편할 때 나를 부축해 줄 사람은 아내뿐이란 걸 느끼며 새삼 아내에게 고마움 마음을 전한다.(2011년 11월 초)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제120화 : 쌍둥이는?
제120화 : 쌍둥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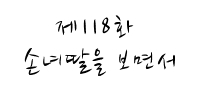 제118화 : 손녀딸을 보면서
제118화 : 손녀딸을 보면서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이라는 놈도
시간이 지나지 한낱 추억거리로만 회자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