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화 : 희아리
요즈음도 이따금 ‘물 먹인 소를 잡다가 적발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곤 한다.
이렇게 「소 장수가 소의 배를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억지로 풀과 물 을 먹이는 짓」을 ‘각통질’이라 하는데, 나는 소 장사를 해 보지 않았으므로 각통질을 해 본 사실도 없거니와 직접 목격한 경험도 없으나 그런 각통질과 비슷한 보고 겪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행위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치부를 목적으로 했다면 좀 ???!)
첫 번째 : 복어에 돌 넣기
1970년도 초반.
누렇게 보리가 익어가기 시작한 5월쯤이면 우리 마을 앞 바다는 복어낚시로 북새통을 이룬다. 서해에서 살던 복어가 동해로 이동해 간다나(?)
이동 사유 및 경로는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복어가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가고 그 복어를 낚기 위한 사람들로 연홍에서 금당도 인근까지는 복어낚시배로 꽉 찬다는 것이다.
나도 그곳에서 딱 한 번 복어낚시를 해 본적이 있는데 이게 낚시라기보다는 숫제 트위스트 춤에 가까웠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낚싯줄 끝에다가 낚시를 다는 것이 아니라 발이 세 개인쇠갈고리를 달아 복어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그 갈고리를 빠뜨리고서 시울질을 하는데 그 시울질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한 참을 그렇게 트위스트 춤 아닌 춤을 추다 보면 ‘턱’하고 묵직하게 걸려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나가는 복어가 갈고리에 찍히는 감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복어가 내 것이 된 것은 아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뜨린 낚싯줄은 바다 속에 얽히고설켜 있는데 그 속을 무사히 헤쳐 나와야만 진정한 나의 복어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어가 낚이는 순간부터 아주 재빠르게 낚싯줄을 당겨야 한다. 나의 경우 딱 한 번 복어가 물렸는데 낚싯줄을 빼는 솜씨가 아무래도 서툴러서 복어가 남의 낚싯줄에 얽혀 결국은 놓쳐버렸다.
이때 낚은 복어는 수출회사에서 파견한 사람과 현장에서 무게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사람들이 복어의 무게를 늘리기 위하여 복어 배에다 자갈을 넣는다는 것이다.
얼마라도 값을 더 받으려는 먹고 살기 위한 행위였다고 이해했으면 한다.
두 번째 : 고춧가루에 소금 넣기
고춧가루가 금추가루라는 말을 낳았던 1978년 가을.
〇〇 부근에 있는 〇관구사령부 산하 〇급양대(각 부대에 쌀과 된장을 제외한 각종 부식을 배급하는 부대)에서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급식과장으로부터 괴상한 명령을 받았다. 고참 병장으로 고추 빻는 것을 감독하고 있는 나에게 한가마니의 소금을 갖다 주며 고추에 골고루 넣어서 빻으라는 아주 괴상한 명령!
나중에 알고 보니 고추에 소금을 넣으면 무게가 늘어난다나!
어디 그 뿐인가!
맵지는 않지만 색이 아주 빨간 고추를 남아메리카 어디에선가 조금 들여와서 탄저병으로 누렇게 색이 바랜 우리 국산고추(이런 고추를 ‘희아리’라고 한다)와 섞어서 빻아 정상적인 고춧가루인 것처럼 만들어 배급했던 기억들이 씁쓸하다.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개 사병이 어찌 장교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겠는가마는 아직도 이러한 기억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부당한 명령을 당당하게 거부하지 못했던 내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었다는 죄책감이 아직까지 나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나 하여 여기에서 ‘죄송합니다!’하고 사죄한다.
세 번째 : 할머니의 무화과는?
나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홍성세무서 서산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무슨 좋지 못한 일로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이유로 일시 귀양을 간 셈이다.
‘굴을 따랴 전복을 따랴 서산 갯마을’이라는 노랫말에서나 들어 봤던 서산엘 나의 애마로 집사람과 같이 처음 가보는데 왜 그리나 멀고 험하던지!
그러나 거의 다섯 시간동안 차를 몰아 도착한 그곳은 노랫말에서 나오는 그런 갯마을이 아닌 시청뿐이 아니라 검찰청 지청이 있고 세무서 지서가 있는 당당한 시가지였다. 서산에서 만리포 해수욕장까지는 약 40여 Km쯤 될까?
한편 당시는 토요일에도 반일 근무를 하였다. 그해 가을 어느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마친 나는 ‘어서 빨리 집에 가자’하고 바쁜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지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찾아가려 해도 찾아 갈 수가 없는 어느 시골의 2차선 국도의 주변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를 파는 움막들이 많이 보였다.
나도 포도를 조금 사려고 차를 천천히 몰면서 탐색을 하다가 70세가 조금 넘었을 성 싶은 할머니 두 분이 팔고 계신 곳에서 차를 멈추었다.
어머니와 같은 이런 할머니들이 설마 속이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 박스를 사 왔는데 역시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다.
그 할머니들도 생산된 포도를 팔아야만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내가 사가지고 온 포도는 반 정도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
희아리 : 약간 상한 채로 말라서 희끗희끗하게 얼룩이 진 고추.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제5화 : 물질
제5화 :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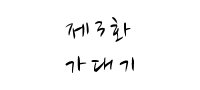 제3화 : 가대기
제3화 : 가대기

















기억을 더듬어 살을 붙이고
또 지웠다가 다시 쓰고
몇 번이나 교정을 해 보지만
아직은 내 마음을 꽉 채우지 못한다.
그러나 어쩌랴.
이게 나의 한계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