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화 : 풀등
10월의 한 가운데인 지난 10월 15일(금요일)에 달그림자 형님에게서 ‘내일, 토요일인데 무슨 계획이 있느냐?’는 전화가 왔다. ‘아직 계획이 없다’는 나의 대답에 금산엘 가잔다. 내년에 퇴직하고 짓겠다는 집의 터를 닦기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계약하여 놓았단다.
집사람과 나는 시간이 나면 갯바위 낚시라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때를 가늠하여 보면서(한조금이라 물때가 좋지 않아 낚시는 즉시 포기하였는데, 뒤에 알았지만 형님도 녹동에서 미끼를 사가지고 왔다) 그냥 구경삼아 같이 가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6시에 광주를 출발한 우리는 녹동에서 붕어빵과 호떡, 어묵으로 대충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우두 마을에 도착했는데.
아뿔싸! 그냥 구경이나 하겠다는 나의 생각이 한참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기에는 채 십 분이 걸리지 않았다.
마을의 소방도로를 내기 위하여 이쪽이 뜯기고 저쪽이 뜯겨 결국 허물어진 우리 집의 옛터는 임시방편으로 그 흉한 모습을 감추고는 있었지만 손질하지 않은 과일나무며 일부 몰지각한 마을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로 엉망 그 자체였다.
새로운 집터를 만들면서 나오는 좋은 흙(황토)으로 성토를 하기 위하여 그 쓰레기들을 치우고 제멋대로 자라 볼품없는 나무들을 베어낼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
도착한 즉시부터 일을 시작한 우리는 금세 땀범벅이 되었으며, 입고 온 나들이옷과 내가 즐겨 신는 운동화도 흙으로 엉망이 되고 찢기어 마누라에게 핀잔께나 들었다.
멀리 장흥의 천관산이 보이고 또 우리의 산이 올려다 보이는 마을 풀등의 팽나무 아래에 만들어진 쉼터에서 형수님이 손수 지어 온 점심을 먹으면서 형님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미리 언질이나 주었으면 옷가지라도 준비해 왔을 것 아니냐?’고 원망을 했더니, ‘그렇게 말했으면 네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명 대답이다.
나는 위에서 ‘풀등’이라는 단어를 썼다.
나의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99.9%는 맞다는 생각으로 글을 이어간다.
우리가 어릴 적,
마을의 바닷가는 갯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을 조성되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아름드리 소나무였다.(아니 딱 한 그루 지금까지 남아있는 아주 오래된 팽나무가 있었지!) 그곳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그네도 탈 수 있을 만큼 큰 소나무들이었다. 근래에 와서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느라 그 큰 소나무들은 베어져서 가뭇없고 다른 나무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어린 우리가 항상 뛰어 놀던 그곳을 어른들은 ‘불등’이라고 하였다.
우리말을 찾고 연구하면서 나는 왜 그곳을 ‘불등’이라고 하였을까? ‘불등’이 무엇인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소제목인 ‘풀등’을 발견하고는 ‘아, 이것이었구나!’하고 무릎을 탁 친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 이 풀등에서 놀면서 앞으로 바라보면 멀리 천관산이 동경으로 다가왔었고, 우리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산이 뒤쪽으로 우뚝이 보이는 곳.
지금도 고향을 찾으면 차를 세우고 내려 누구 한 사람 없어도 앉아 쉬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곳.
그러다가 행여 마을 사람이라도 만나면 안부를 물으며 막걸리 잔을 돌릴 수 있는 곳.
물살을 가르며 쾌속으로 거문도로 가는 배가 보이고 느린 듯 빠르게 제주도로 가는 배가 보이는 곳. 바로 이곳이 ‘풀등’이었던 것이다.
아, 형님은 곧 고향으로 귀향 하신다는데 나는 언제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그 동무들은 언제나 다시 볼 수 있을까?
풀등 - 강물 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 흔히 하류에 많이 생긴다.
가뭇없다 - ①보이던 것이 전연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다.(홍수로 가 뭇없는 집터에서 나는 ……) ②눈에 띄지 않게 감쪽같다.
(2010년 가을에)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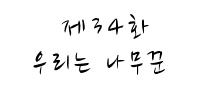 제34화 : 우리는 나무꾼
제34화 : 우리는 나무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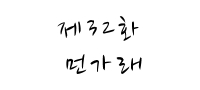 제32화 : 먼가래
제32화 : 먼가래

















그리운 옛동무들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곳이 불등이면 어떻고 풀등이면 어떠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