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화 : 홍두깨
홍두깨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꽤 친숙한 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속담들 중에 홍두깨와 관련된 것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닌 밤에 홍두깨’,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
’홍두깨로 맞고 담 안 넘은 소 없다‘ 등등.
이 속담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홍두깨’라는 것은 방망이보다는 크면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도 ‘단단한 나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렇듯 우리에게 친숙한 홍두깨이지만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 역시 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아니 보기는 보았을 텐데 기억에 없을 것이다. 그저 다듬이질을 할 때에 다듬잇감을 감아서 사용했다는 아련한 기억밖에.
그런데 이 ‘홍두깨’에는 아래의 풀이 내용과 같이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①의 뜻 외에도 ②와 ③의 뜻이 더 있었으니 그것이 ‘홍두깨’를 소재로 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②의 뜻은 별 의미가 없으니 ③의 내용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자.
내가 쟁기질을 배워보려고 했던 그 시절.
송아지가 조금 커서 코뚜레를 뚫으면 쟁기질 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맨 흙바닥에서 쟁기가 아닌 조금 무거운 짐을 끌게 하여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제는 모래밭에서 모래를 가는 쟁기질을 연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차츰차츰 강도를 높여가며 다음에는 밭갈이, 고구마 캐기 등으로 단련되어야 이제 마지막 논갈이용으로서 어엿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다.
나의 경우 쟁기질에 숙련된 소로 모래밭에서 연습을 하였다. 처음에는 쟁기가 깊이 들어갔다가 위로 치솟았다가 제멋대로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갈피를 못 잡았지만 그것도 기술인지라 차츰 연습의 효과가 나타나 쟁기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반듯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 처음에는 무겁기만 한 쟁기였지만 이제는 무겁다고 느껴지지 아니한 것은 그만큼 내 몸과 마음과 쟁기가 하나로 일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실전이다.
고구마 캐기가 끝나고 보리를 파종하기 위하여 밭을 엇갈고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 쟁기질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패였다. 아직은 실력부족이었던 것이다.
그 후로 아직 쟁기질을 하여 보지 못 했으니 결국 나는 쟁기질을 못 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부끄럽지는 않다. 그 이유는 나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쟁기질을 못할 것이며, 또한 요즈음에는 쟁기질이 아닌 트랙터로 밭을 갈기 때문에 쟁기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나 같이 쟁기질에 서투른 사람이 쟁기질을 할 때 갈리지 않은 부분의 흙을 홍두깨라고 하는 사실을 새로이 알고서 기쁜 마음에 이 글을 썼지만 다듬이질이 없어진 지 오래고 쟁기질도 사라지고 있는 현대의 세태에 비추어 홍두깨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홍두깨 - ①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에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도구. ②소의 볼기에 붙은 살코기. ③서투른 일꾼이 논밭을 갈 때에 거웃 사이에 갈리지 아니하는 부분의 흙.
잠깐, 사족을 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에서의 ‘홍두깨’는 풀이①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밝히기는 좀 거북하니 각자가 상상하기 바란다.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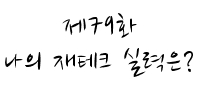 제79화 : 나의 재테크 실력은?
제79화 : 나의 재테크 실력은?
 제77화 : 지르신다
제77화 : 지르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