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화 : 영각
앞의 글 제75화 ‘워낭’에서 30여년을 동고동락했던 소의 무덤을 날마다 찾는다는 최원균 옹의 이야기가 암시하듯이 예부터 ‘소’라는 동물은 우리네 농가에서 제일로 치는 가축이었다.
제이차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강제로 공출하였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품목과 수량으로 우리 국민들은 숫제 약탈을 당하는 심정으로 일본을 원망하였다.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깊숙이 숨겨 놓은 한 줌의 쌀은 물론이요, 내년에 볍씨로 사용할 벼까지 찾아냈고, 심지어는 놋그릇, 놋수저 등 모든 쇠붙이와 가축들도 공출하였다. 하기야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사람까지 강제로 공출(?)하였으니 더 말해 무어할까!
그런데 이 공출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약탈당할 때는 원망과 한숨뿐이었는데 소를 공출당할 때는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는 기록은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러나 총칼을 앞세워 강탈하는 그네들의 힘을 어찌 막을 수 있었으리요!
이따금씩 화가 나면 그 야무진 뿔로 아무 물건이나 닥치는 대로 들이 받았던(이렇게 하는 것을 ‘뜸베질’이라고 함) 소(이런 소를 ‘부사리’라고 함)였지만 그도 저 죽으러 가는 것을 아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음무~, 음무~’ 하면서 뒷걸음쳤다는데, 자식 같이 애지중지 키워왔던 소를 무지막지하게 차에 싣고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은 자식을 총알받이로 내 보내는 그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소를 빼앗긴 각 농가들은 이제는 인근에 농사를 지을(논밭을 갈) 소마저 없어 저 멀리 고개 너머 마을까지 소를 빌리러 가야 하는 심정을 묘사한 대목을 어느 소설에서 읽은 적이 있다.
우골탑!
6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던 우리 선배들은 대학교를 우골탑이라고 불렀다.
지금이야 건물의 층수도 낮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그 시절의 광주에 있는 ○○대학교는 무등산의 기슭 아래서 뾰쪽뾰쪽 10층의 탑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탑이 농촌의 학생들이 소를 팔아 쌓은 탑이라는 뜻이었으리라. (위용을 자랑하는 다른 대학교의 건물들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과 같이 귀하게 여긴 소를, 그러나 소보다는 귀한 자식의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배내’를 하여 소를 기른다.
배내는 ‘남의 가축을 새끼 때부터 길러 다 자라거나 또는 새끼를 낸 뒤에 임자와 나누어 가지는 제도’인데 우리 금산에서는 주로 송아지를 길러 그 송아지가 자라 새끼를 낳으면 어미 소는 임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낳은 송아지는 길렀던 사람이 가지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이제 또 몇 년이 지나 배내서 키운 그 송아지가 커서 어른 소가 되면 둘째를 위해서 똑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말이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소를 농사용으로 키우는 경우는 없어지고 지금은 모두 식용으로만 키우는데 그마져도 저 망할 놈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하여 말썽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뭉게구름이 둥실 떠가는 좋은 날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다가 제 짝이나 새끼를 ‘음무우~, 음무우~’ 하며 부르는 소의 ‘영각’을 들을 기회는 영영 없을 것 같다!
뜸베질 - 소가 뿔로 물건을 닥치는 대로 들이 받는 짓.
부사리 - 머리로 잘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
배내 - 남의 가축을 새끼 때부터 길러 다 자라거나 또는 새끼를 낸 뒤에 임 자와 나누어 가지는 제도.
영각 - 소가 길게 우는 소리. 주로 새끼나 암소를 그리며 우는 소리를 이름.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제81화 : 든버릇난버릇
제81화 : 든버릇난버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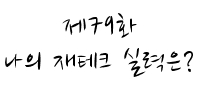 제79화 : 나의 재테크 실력은?
제79화 : 나의 재테크 실력은?

















태풍이 온단다.
마침 내일 금산엘 갔다가 모레 와야 하는데
태풍맞이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