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화 : 아람
나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본 이름은 金哲鏞(김철용)인데 우리 金海 金氏 족보에는 金哲鎬(김철호)로 등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 날 때에는 우리가 수로왕의 74세손으로 이름 끝 자가 鏞자 돌림이 맞았는데 족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로왕의 72세손으로 확인되어 鎬자 돌림이 맞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철호라는 이름을 하나 더 얻게 된 것이다.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참고로 73세손인 나의 아들 大賢이가 永賢이로 올라 있는 것을 보면 73세손은 이름 첫 자인 永자가 돌림자가 되는 모양이다.
평생을 자기를 대신하여 나타내고 있는 이름은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선택에 지어져서 불리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름의 앞자리 또는 뒷자리를 돌림자로 지었지만 요즘에는 그 돌림자나 한자를 무시하고 뜻도 좋고 듣기 좋은 한글 이름을 자식들에게 붙여 주고 있는 것이 유행인가 보다.
나의 조카들(형의 자식들과 동생의 자식들) 이름도 전부가 한글 이름이다.
그 한글 이름이 어린아이 때에는 참 부르기도 듣기도 좋은데 나중에 그네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나의 생각은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
그 조카들의 이름 중에 ‘아람’이가 있다.
이 ‘아람’의 뜻이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인데 형님과 형수님은 그 뜻을 알고 지었을까?(물론 시인(詩人)이신 형님이 그 단어의 뜻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지은 속마음은 아직도 모르겠다)
이 ‘아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노라니 문득 율곡 선생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율곡 선생이 세 살 되던 해에 선생의 외할머니께서 뜰의 정원에 빨갛게 익어서 벌어져 있는 석류를 가리키며 저것이 무엇이냐? 하고 선생에게 물었더니 ‘부서진 빨간 구슬을 껍질이 싸고 있다’고 답했다는.
바로 그런 것이 ‘아람’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 익지 못한 채로 떨어진 과실’도 있는데 이것을 ‘도사리’라고 한다.
또한 ‘못자리에 난 어린 잡풀’도 ‘도사리’라고 하는데, 이 도사리는 모를 심을 때 갈아엎어도 다음 해에는 또 어김없이 자라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래 오래 사는 할머니’를 ‘도사리 할매’라고 하는 사투리가 생겨난 배경이 되었다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한편,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속껍질이 있는데 이것을 ‘보늬’라고 한다.
기왕 이름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하자.
오늘 신문에서 개명(이름을 바꿈)에 대한 특집기사를 보았다. 각자의 여러 가지 개명 사유 가운데 ‘강우람’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청년의 경우가 재미있어서 올린다.
그 친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강우람입니다.!’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면, 상대방 백이면 백 모두가 ‘우람?’하고 이름을 되뇌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것이다. 왜?
애석하게도 강우람 씨는 체격이 우람하지 못하고 무척 왜소하다는 것이다.
강우람이라는 이름이 풍기는 이미지와 강우람 씨의 실체가 걸맞지 않은데서 오는 황당함의 표시에 정작 본인은 심한 자괴감을 느껴 개명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보며 내 동생의 아들인 우람이를 생각해 본다.
‘우람하다’의 뜻이 ①기골이 장대하다. ②우렁차거나 요란스럽다. 이니 동생은 아마 ①의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다행히 현재 고1인 우람이는 키도 180Cm가 넘고 몸무게도 80Kg이 넘으니 이름값은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큰아버지로서의 욕심은 덩치만 우람할 것이 아니라 의식도 우람했으면 하는데……
아람 -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
도사리 - 다 익지 못한 채로 떨어진 과실.
도사리 - 못자리에 난 어린 잡풀.
보늬 -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제47화 : 의암송
제47화 : 의암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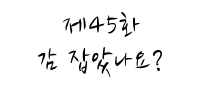 제45화 : 감 잡았나요?
제45화 : 감 잡았나요?

















3월의 마지막 주의 첫날.
날씨가 쾌청하여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하루의 시작이다.
다들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