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화 : 물질
주로 해녀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물질’이라고 한다.
이 물질을 해녀들이 많다는 제주도에서도 요즈음은 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쇠머리 앞 바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물질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으니.......
대략 5~6톤 정도 되는 통통배는 10여 명 남짓한 해녀들을 싣고 다니다가 해녀들이 채취할 만한 해산물이 있음직한 바다의 곳곳에다 해녀들을 떨구어 준다. 그러면 해녀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바다의 곳곳을 헤엄쳐 다니면서 전복이나 소라, 그리고 성게 등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간 그녀들인지라 물속에 오래 있지 못하고 대략 2~3분이 지나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내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고개를 내밀 때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후유우~~~’하고 길게 내쉰다. 이렇게 내쉬는 숨소리를 ‘숨빗소리’라고 한다. 그리고 채취한 해산물을 넣는 그물망을 ‘망사리’라고 하며, 망사리를 매어 놓고 거친 숨을 고르면서 지친 몸을 쉬기 위하여 잡고 있는 뒤웅박을 ‘태왁’이라고 한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여 그 부근의 해산물을 다의 채취하였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통통배는 다시 와서 그녀들을 싣고 새로운 작업장을 찾아 ‘통통통통~~~~‘ 하고 떠나가는 광경을 우리는 자주 목격했던 것이다.
한편 제주도 토박이말로 ‘정낭’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로 걸쳐 놓는, 길고 굵직한 나무.」를 이른다.
정낭은 통상 3개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정낭이 하나도 걸쳐 있지 않으면 집에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되며,
정낭이 하나만 걸쳐 있으면 집안에 사람이 없으나 곧 돌아온다는 의미이고,
두 개의 정낭이 걸쳐 있으면 저녁 때 쯤 돌아온다는 표시(금일 중에 돌아온다는 표시)가 되며,
세 개의 정낭이 모두 걸쳐 있으면 집에서 먼 곳으로 출타했다는 표시이다.
각설하고,
나는 이 정낭을 ‘현물이 존재하고, 제주도를 여행하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함’에도 이를 제주도 방언이라고 함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표준어로 등재해 달라고 국립국어문화원과 오랫동안 언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제주도라는 한 지방에서만 쓰이고 있어 표준어로 등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
알고 있는 대로 표준어규정 총칙 제1항을 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울말은 ‘서울 사람이 쓰는 말’이다.
그들의 논리라면 결국 아무리 좋고 토속적인 것이라도 서울에 있지 않고 한 지방에만 존재하는 것은 표준어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또한 예예인 강호동이 1993년에 구입했다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그의 별장도 입구가 ‘정낭’으로 되어 있다던데 그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현대는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아닌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곳이다. 곧 제주도의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규정에만 얽매인 국립문화원의 편협함에 실망이 크다.
태왁 - 원래는 제주도에서 해녀가 바다 속에서 몸을 의지하고, 또 채취한 해산물을 넣는 망사리를 매어 놓기 위하여 띄어 놓은 둘레 80-90cm 정도의 큰 박을 사용하여 만든 뒤웅박. 또한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배 위에서 노래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두드리던 대용 악기로도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문명의 발달로 스치로폼으로 만든 것이 사용되고 있어 악기로서의 기능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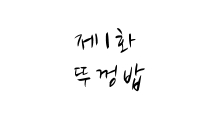












 우리말을 찾아서(제6화 : 감풀)
우리말을 찾아서(제6화 : 감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