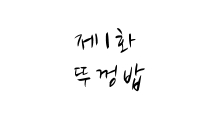제43화 : 고랑+두둑=이랑
작년에는 가을 가뭄으로 고구마가 크기를 멈췄다고 하더니 올해는 비가 너무 많아 고구마 밑이 잘 들지 않았다고 한다.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았던 어린 시절을 겪어서 고구마를 심고 수확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나도 고구마가 이렇게 가뭄과 장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는 미처 몰랐다.
아무래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짓는 농사를 곁에서 거들어줄 뿐이었던 나인지라 농사와 가뭄과 비에 대한 역학관계를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이른 봄에 방안의 두지(뒤주의 사투리)에 쌓여 있는 고구마에서는 저절로 움이 터 나오는데, 그 때 즈음에 우리 부모들은 그 고구마를 밭에 심어 고구마 순을 기른다. 그 심는 밭을 ‘무강밭’이라 하였고 그 심는 행위를 ‘무강 논다’ 또는 ‘무강 심는다’라고 하였다.(참고 : 경상남도 남해에서는 고구마를 ’무강‘이라고 한다)
무강밭에서 움은 봄날의 따뜻한 햇볕과 양분을 먹으면서 고구마 밭으로 옮겨 심어질 그날만을 기다리며 너울너울 넝쿨을 이루며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고구마 순’이라고 한다.
이른 여름.
이모작을 하는 밭의 보리를 베어내고 쟁기질을 하여 ‘이랑’을 만들어 두었다가 비가 오면 우리는 고구마를 심는다.
잘 자란 고구마 순을 약 20~30cm 정도로 심기 좋게 잘라 이미 만들어 놓은 밭의 ‘두둑’에다 심으면 뿌리식물인 이 고구마는 엔간한 가뭄에도 잘 견디면서(?)초가을에 우리에게 맛있는 햇고구마를 선사하는 것이다.
여름 방학이 끝날 즈음에 밭두둑의 잘 자라 얽히고설킨 고구마 순을 헤쳐 보면 두둑이 쩍 갈라진 곳이 있는데 그 곳을 허브면(하비면의 사투리) 어김없이 어린 학생들의 주먹만 한 고무마가 크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0월 중순 쯤 되면 본격적인 고구마 캐기가 시작되는데 이 고구마 캐기는 손포가 많이 필요해 품앗이로 일을 한다.
전날에 두둑의 고구마 순을 다 걷어 내고 당일에는 쟁기질로 고구마를 캐는데 쟁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갖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뒹굴고 그 뒤를 따르는 엄마들이 고구마를 주워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고구마는 가을 및 겨울의 식용으로 사용할 것과 절간고구마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구분되어 식용으로 사용될 것은 집으로 운반되고 나머지는 빼갱이로 만들어 진다.
한편, 고구마 순을 길러내고 난 무강은 양분이 전부 빠져나가 사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쪄서(삶아서) 대부분 돼지 사료로 이용되었으나 어쩌다가 하나씩은 먹을 수도 있었는데 역시나 양분이 전부 빠져 나간 그 무강의 맛은 새삼 여기에서 말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또한 고구마 순은 꼴이 나지 않은 겨울에 소의 좋은 먹이로 사용된다.
고구마 관련 기사를 보고는 고무마를 심고 캐는 일이야 우리 금산 사람들에게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위의 소제목인 고랑, 이랑 두둑과 기타 관련된 우리말을 소개하고자 주저리주저리 몇 자 적었다.
거웃 - 논이나 밭을 쟁기로 갈아 넘긴 골.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고랑 - 두둑한 땅과 땅 사이에 길고 좁게 들어간 곳.
두둑 - ①밭과 밭 사이에 길을 내려고 흙으로 쌓아 올린 언덕. ②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만든 두두룩한 바닥. 물갈이에는 두 거웃이 한 두둑이고, 마른갈이나 밭에서는 네 거웃이 한 두둑이다.
이랑 -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사래 - 이랑의 길이.(재 넘어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뇨).
사래 - 묘지기나 마름이 수고의 대가로 부쳐 먹는 논밭.
손포 - ①일할 사람. ②일할 양.
품앗이 - 힘든 일을 거들어 주어서 서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품 갚다 - 자기가 앗았던 품을 갚음으로 상대자에게 품을 제공하다.
품 앗다 - 자기가 제공한 품의 갚음으로 상대자의 품을 받다.
하비다 - ①손톱이나 날카로운 물건 따위로 조금 긁어 파다. ②남의 결점을 드러내어 헐뜯다. ③아픈 마음을 자극하다.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