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화 : 남사당패
내일이 음력으로 정월대보름이다.
실질적인 새해의 시작인 정월대보름이면 농가에서는 달집을 태우며 새해의소원을 빌기도 하였다지만 우리 금산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해태 건장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마름(금산 사투리로 날개) 등으로 만든 건장은 불에 취약해 불놀이는 가급적 피했을 것이리라. 또한 설날부터(실제는 훨씬 그 이전부터) 날리던 연을 멀리 띄어 보내기도 했고, 부럼을 깨물기도 하였는데 그보다도 더더욱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지신밟기이다.
우리가 어렸을 적 정월 대보름날이면 우리 마을에서는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지신(땅을 맡은 신령)을 달래고 복을 비는 민속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신밟기라고 하였다.
농악대는 그 집의 마당·뜰·부엌·광·장독을 두루 돌며 지신을 위안했다.
지신을 밟으면 터주가 흡족해 하여 악귀를 물리쳐 주인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가족의 수명과 건강을 지켜주며 풍년이 들게 해준다고 하여 농악대를 맞이한 집주인은 주안상을 차려 대접하고 금전·곡식으로 사례하는데, 이렇게 모은 금품은 마을의 공동사업에 썼다.
어린 우리는 그 농악대 뒤를 따라 다니며 같이 신명나게 뛰어놀면서 집주인이 내 준 음식(설을 쇠고 난 직후라 떡과 고기 등이 있었다)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뚜렷하다.
그럼 농악(農樂)은 무엇인가?
농악은 원래는 굿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민속놀이가 포함된 음악으로 지방마다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어 매우 다채롭다고 할 수 있다.
농악은 파종과 추수를 축복하고 그 해 농가의 안녕을 신에게 기원했다는 설, 농민군을 훈련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진법을 악무(樂舞)로써 지휘 훈련케 한 것이 점차 농악으로 발전하였다는 설 등 여러 설이 있다.
우리 금산의 전남무형문화재(27호)로 지정된 월포문굿도 원래는 군악으로 사용된 매귀굿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한편, ‘사물놀이’라고 있는데, 이는 사물(四物 : 꽹과리, 징, 장구, 북)인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풍물놀이(농악)의 타악기 가락을 긴장과 이완의 원리에 맞게 재구성하여 음악화한 것이다.
‘사물놀이’라는 이름은 민속학자인 심우성이 1978년에 창단한 놀이패의 명칭이었는데 지금은 예술 갈래를 지칭하는 보편적 용어가 되었다고 한다.
이 사물놀이는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다양한 가락으로 연주하기 시작한 이후 여러 놀이패들이 생겨서 지금은 사물놀이 연주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반인들도 많이 연주하고 있다.
각설하고 글의 제목인 남사당패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조선후기에 광작현상(:조선 후기에 농민들이 경작지를 늘려서 넓은 토지를 경작하려던 현상)의 발생으로 설자리를 잃은 농민들은 유리걸식하거나 화적떼에 동참했고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재주를 익혀 유랑연예인집단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유랑연예인집단에는 남사당패, 사당패, 걸립패(일명 비나리패)가 있다.
이들이 펼치는 재주는 거의 비슷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하는 남사당패는 여섯 가지 놀이가 주를 이루는데 그것들이 풍물(농악), 버나(대접 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베기(탈놀이), 덜미(꼭두각시놀음)이다.
이렇게 남사당패가 남자들로 구성된 것에 비해 사당패는 그 주구성원이 여자이다. 일명 여사당으로 통하는 이패거리는 가무희(歌舞戱)를 앞세우고 매음을 하는 것인데 맨 위에 모갑(某甲)이란 서방격의 남자가 있고 그 밑으로 거사(居士)라는 사나이들이 제각기 사당 하나씩과 짝을 맞춘다.
또한 걸립패(일명 비나리패)는 우두머리격인 화주를 정점으로 비나리(고사)꾼, 승려 혹은 승려 출신이 맡음), 보살, 잽이(풍물잽이), 산이(2-3인의 버나 ), 탁발(얻은 곡식을 지고 다니는 남자) 등 15명 내외로 한 패거리를 이룬다.
여기에서 ‘비나리’는 사물의 가락 위에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얹어 부르는 것으로 ‘빌다’의 명사형으로 어떤 절대자에게 소원하는 바를 비는 행위를 나타내며 우리민족 고유의 신앙행위를 말한다. 즉, 비나리는 소리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고사소리라는 순 우리말이다.
이렇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생겨났다가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풍습을 이제는 겨우 책에서나 볼 수 있음을 아쉬워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어떤 좋은 풍습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를 고민해 보면서 마친다.
꼭두쇠 : 남사당패의 우두머리.
어름사니 : 남사당패에서 줄을 타는 줄꾼.
비나리 : ①걸립을 업으로 삼는 사람. ②걸립패가 마지막으로 행하는 마당굿에서 곡식과 돈을 상 위에 받아 놓고 외는 고사 문서. 또는 그것을 외는 사람. ③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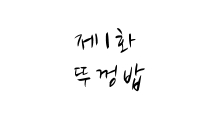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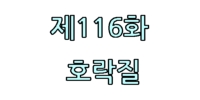 우리말을 찾아서(제116화 : 호락질)
우리말을 찾아서(제116화 : 호락질)
 우리말을 찾아서(제114화 : 께끼다)
우리말을 찾아서(제114화 : 께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