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게 지금 여행할 시간이 있다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강원도 영월이다.
영월은 내가 두 번인가 가본 적이 있었지만 또 가오고 싶은 이유는 그 곳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동경했던
사람이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난고 김병연 선생님!
우리에게는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더욱 많이 알려진 천재시인 김삿갓.
정비석 선생님께서 1985년엔가 「소설 김삿갓」발표하면서 머릿글에 당시 선생님의 묘소를 찾아가는 길을
묘사한 대목을 읽은 기억이 있어 여기 싣는다. 그 때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정도의 깊은 골짜기였는데
이제 그 곳을 성역화해서 선생님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다고 하고, 또 매년 10월에는
삿갓문화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가봐야겠다.
죽장에 삿갓 쓰고 전국을 떠돌던 김삿갓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1863년 3월 25일, 57세의
나이로 전라도 화순군 동복면에서 객사를 하게 된다. 부친의 행방을 찾아헤매던 익균은 부친의 유골을 자기
집 가까운 영월로 이장을 해온다.
역사적 기록은 여기까지였다. 이후 김삿갓이라는 이름은 조선 팔도의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 없이 세월을
뛰어넘어 전해져 내려왔지만 아무도 김삿갓의 묘에는 관심이 없었다. 까마득하게 잊혀질 뻔했던 김삿갓의 묘
를 찾아낸 것은 80년대 초 영월 읍내의 유지였던 고 박영국 선생 덕택이었다.
전국으로 널린 김삿갓의 시편과 일화를 모으며 그 누구도 몰랐던 김삿갓의 시를 39편이나 더 찾아내기도 했던
선생은 영월 구석구석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와석리 노루목에서 김삿갓의 묘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리
하여 안동 김씨 대종회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사초를 하고 정식으로 묘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것이 84
년도의 일이다.
영월읍내에서 와석의 노루목까지는 70리길. 당시만 해도 노루목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와석까지 가서 거기
서부터 20리 산길을 걸어가야 했다. 지금은 그 산길 20리 계곡이 김삿갓계곡이라 하여 모두 포장되어 묘역까
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말이다.
발견 이듬해인 85년 9월에 소설가 정비석은 <소설 김삿갓>을 쓰기 위해 그에 앞서 일흔다섯의 노구를 무릅쓰
고 김삿갓묘를 찾게 되는데 그 일화가 매우 재미있다.
영월읍에서 하동면 와석리까지는 70리밖에 안 된다기에, 지프라면 쉽게 다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50리쯤 가면 제법 큰 개울이 있는데, 만약 지프가 못 건너가게 되면 사람은 옷을 벗고 건너가, 20리쯤은
걸어서 다녀와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70을 넘은 늙은이
가 옷을 벗고 물을 건넌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질색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은 천신만고하여 마침내 와석리의 노루목 마을에 도착하였다. 마을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개울
가 좌우편 언덕배기에 서너 채의 집이 쓸쓸하게 매달려 있을 뿐인 곳이었다. 박영국씨가 경사진 언덕배기
위로 달려 올라가더니, 화전 한 귀퉁이에 오직 하나뿐인 무덤을 가리켜 보이며 말했다.
"이 무덤이 바로 김삿갓의 무덤입니다."
첫눈에 보아도 외롭기 짝없는 무덤이었다. 그 무덤 앞에는 높이가 두어 자 가량 되어보이는 묘비가 서 있는
데 그 묘비에는 "蘭皐 金炳淵之墓"라는 일곱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렇듯 김삿갓묘는 발견되고 나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한동안 관리도 소홀하게 이루어졌으며
찾는 이들도 뜸한 편이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초부터 진입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묘지 부근 밭을 모두 사
들여 묘역일원을 개발하면서부터 전국에서 시인을 기리는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98년에 제1회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가 개최된 이후 매년 10월이면 묘역일원에서 문화제가 열리며, 근처에
김삿갓문학 기념관이 건립예정이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간 골짜기에 김삿갓 생가가 복원 예정에 있다.
글 서두에서 밝혔듯이 어렸을 적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동경했던 사람은 난고 김병연 선생님이었다.
어찌 감히 나 같은 필부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만 내가 그 분의 겉 흉내라도 내볼 욕심으로 그 분이 쓰고 다니
셨던 삿갓을 구하여 듬뿍 술(막걸리)에 절여서 현관의 벽에 걸어 둔지가 어언 20여년!
그 때만 해도 내가 그 삿갓을 쓰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 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우리 마눌님이 글쎄 최근 언젠
가 나도 모르게 그 삿갓을 창고에다 옮겨 놔 버렸지 아닌가.
몇 년 전만 같아도 벼락땅불 날 일이만 이제는 (나도 힘이 예전같이 못하여?) 마눌님을 탓할 수가 없어 현관으로
옮겨올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혼자서만 내색도 아니하고 몰래 창고에 가서 삿갓을 만져보곤 하고 있으니..........
(혼자 말로) 참 세상 많이 변했다!
집안에 고이 둔 그 삿갓도 20년이 지나자 하얗게 색깔이 바래 가고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40년 동안을 모진 풍상
을 겪었을 그 삿갓은 더 말해 무엇할까!
이 곳 광주의 무등산기슭(제4수원지 위)에도 선생님의 시비가 있어(1978년에 건립했다고 씌여 있음) 이따금씩
(바람 쏘이러) 소주 한 병 들고 다녀오고도 하지만, 이제 마음으로만 동경했던 선생님의 묘소나마 방문할 수 있다
니 그 아니 반가운가.
마지막으로 걸식의 서러움을 숫자를 이용하여 회화적으로(한시의 격식을 파괴하여) 묘사한 선생님의 시 한수를
옮겨 실으며 맺는다.
二十樹下三十客 (이십수하삼십객)
四十村中五十食 (사십촌중오십식)
人間豈有七十事 (인간개유칠십사)
不如歸家三十食 (불여귀가삼십식)
(스무나무아래 앉은 설운 나그네에게
망할놈의 동네에선 쉰 밥을 주는구나
인간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고향집에 돌아가 설익은 밥 먹느니만 못하구나)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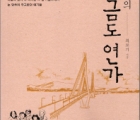
나를 서울로 보내 버리고 가슴이 허전했구나
방랑 시인이 생각나시게
그렇게 내가 보고 싶으면 전화라도 하지
혼자서 그렇게 고독을 삼키며
푸른 가을 하늘에 시선을 주고 있는
철용이가 생각나서 빨리 광주 가고 싶다.
아니면
세무회계론을 뒤적이다가
술잔이 아른거리고
나를 포함해서 친구들의 농담소리가 귀전을 맴돌아
회계론의 "회"자가 허공을 떠 다녀서
친구들과 함께
그 방랑 시인같이 훨훨 날아 다니고 싶어서 그러지
나도 좋아 하는 孤山의 싯귀 한구절을 읊어 줄테니
딴 맘 갖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山中新曲 중 漫興)
광주가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