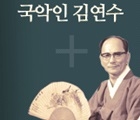사람마다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하는 해가 있을게다. 나에게는 1963년이 잊을 수 없는 해다. 그중에도 한 해가 저무는 12월. 12월에 난 세계 챔피언이 됐고, 스승 역도산은 세상을 떴다. 지금도 스승만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 그것은 1963년 12월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다.
역사엔 '만약'이 없다. 그러나 스승만 생각하면 만약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하고 있다. 나에게 만약은 내가 1963년 9월 세계 챔피언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스승이 작고했을까 하는 것이다. 스승을 항상 그림자처럼 모셨기 때문에 스승이 야쿠자 칼에 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찔렸더라도 내가 병 수발을 들었으면 죽었더라도 각종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곁에 있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
어느덧 스승이 작고한 지 43년이 흘렀다. 스승이 타계한 이후 저마다 스승에 대한 평가를 쏟아냈다. 문제는 스승의 삶이 너무나 왜곡됐다는 것이다. 그 왜곡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했다. 스승 타계 후 일본에선 스승의 국적이 조선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도 스승을 매도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난 스승이 한국에서 왜곡된 이유를 안다. 이는 일제 강점기로 인한 한국인들의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조선인이었던 스승이 일본 국적을 취득해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한국인들이 극히 나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본다.
그러나 그것은 스승의 한 단면만 본 데서 비롯된 것 같다. 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관부연락선을 타고 1940년대부터 일본에서 살았다면 한국말을 사용했겠노라고?" 일본에 살면서 일본말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스승이 조선인을 멸시하고 괄시한 적도 없다. 한국 최초의 복싱 세계 챔피언 김기수를 도와 주었듯이 스승은 동포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 줬다. 내가 스승에게 도움받았던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내가 본 스승은 친일도 반일도 아니다. 그저 스승은 일본에서 야망을 실현시켜 가는 통 큰 사나이였다.
나 역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은 야망에 불타 있었다. 그런 점에서 1963년은 세계 챔피언 야망에 한 발짝 다가선 해이기도 했다. 새해가 밝았던 1963년 1월 4일 동경에서 그해 첫 경기를 펼쳤다. 그때의 경기 결과는 무승부였다. 기왕이면 새해 첫 경기에서 이겼으면 했는데 비겨 아쉬웠다.
사실 1월은 선수들이 링에 오르기를 가장 꺼린다. 달랑 팬티 하나 입고 링에 오르면 추위와 싸워 이겨야 했다. 링에 오르면 턱이 저절로 떨린다. 그 추운 1월에도 열한 차례 링에 올랐다. 그나마 다행은 5~10일 링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승에겐 축복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스승은 그해 1월 7일 약혼식을 올렸다. 상대는 JAL 스튜어디스 출신 다나카 게이코였다. 당시 스승은 일본서 장남 요시히로, 차남 미츠오, 장녀 치에코 등 세 자녀를 뒀다. 스승은 다나카와 결혼 전 아내를 두고 있었다. 난 스승이 왜 그 아내와 헤어졌는지 모른다. 다만 스승이 그 아내와 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
스승의 약혼식 장소는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동경 아카사카 뉴재팬호텔이었다. 스승은 약혼식을 올렸던 이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야쿠자 칼에 맞았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스승은 약혼식 전 가끔 내게 한국의 사정에 대해 질문하곤 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며 묻곤 했다. 나 역시 한국을 떠난 지 수년째라 그들의 이름은 들었어도 그들의 행적에 대해선 몰랐다.
특이했던 것은 1962년말부터 말쑥한 양복 차림의 한국인이 스승에게 자주 찾아왔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승을 만나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스승은 그들이 돌아가면 일본의 대표적 우익 정계 인사 오오노 반보쿠와 만났다. <계속>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나의 삶, 나의 도전] ‘박치기왕’ 김일 [65]
[나의 삶, 나의 도전] ‘박치기왕’ 김일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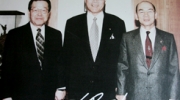 [나의 삶, 나의 도전] ‘박치기왕’ 김일 [67]
[나의 삶, 나의 도전] ‘박치기왕’ 김일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