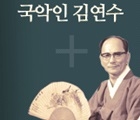난 처음 장훈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지 몰랐다. 스타일과 외모로 봐선 한국인이 아닌가 생각은 했지만 일본 문화에 더 익숙한 것 같아 일본인 야구 선수로 생각했다.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우연찮게 전해 들었다. 나도 레슬링 선수로 점차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다. 이때 동료 누군가 "한국인 대단하다. 한 사람은 야구 선수로, 또 한 사람은 레슬러로 유명하니"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장훈도 한국인이란 사실을 알았다.
그가 도장으로 다시 오면 한국인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 보고 싶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에게 다가가 우리말로 "한국이 고향이냐"라고 슬쩍 물었다. 그는 "고향은 일본 히로시마다. 그러나 부모님의 고향이 한국이어서 난 한국인이다"라고 우리말로 답했다.
장훈은 우리말을 또벅또박 잘했다. 그와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우리말을 실컷 사용했다. 일본서 동포를 만나면 모를까 한국어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지만 그가 왜 스승 역도산과 정건영을 "형님"이라고 호칭했는지 알 것 같았다. 또 스승이 그를 친동생처럼 끔직히 챙겨 줬는지도. 일본서 한국인이란 사실을 숨기며 살았지만 스승은 마음속 한편에 진한 동포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스승은 장훈이 도장에서 체력 훈련을 끝내면 데리고 가서 고기를 잘 사 줬다. 운동 선수는 힘이 좋아야 한다면서 데리고 간 곳은 불고기집이었다. 장훈은 스승을 스포츠맨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존경했던 듯하다.
장훈이 도장으로 오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도 그와 더 친숙해져 갔다. 가끔 어울려 술도 한잔 했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과거 얘기도 들려주었다. 대부분 힘든 운동과 고국에 관한 얘기였다.
장훈과 대화하면서도 손가락 장애가 있었는지 몰랐다. 알고 보니 어렸을 적 입은 화상으로 오른손 두 손가락이 붙어 버렸다. 야구 선수에게 손가락은 생명이나 같다. 손가락을 다치면 방망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고 또 칠 수도 없었다. 그가 왜 남몰래 도장으로 달려와 독을 품고 훈련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장훈은 피눈물 나는 훈련 끝에 일명 '광각타법'(부챗살타법)을 만들어 냈다. 상대 투수가 좌완이든 우완이든 개의치 않고 타구를 좌·중·우 어느 방향으로든 날려 보낼 수 있는 이 타법은 당시로선 장훈만의 전유물이었다. 그것은 체력 훈련이 뒷받침돼서 이뤄진 산물이다.
장훈은 나의 후배지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 중 한명이다. 스승도 그런 그가 대견스러웠던 모양이다. 스승은 가끔 이런 말도 했다. "장훈처럼 투혼 정신이 있는 선수가 레슬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아쉬워했다.
스승은 장훈이 도쿄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달려가서 격려 응원도 해 줬다. 만능 스포츠 선수였던 스승은 야구도 곧잘 했다. 또 장훈은 보답이라고 하듯 프로레슬링 경기장을 자주 찾아왔다. 주로 정건영과 함께 왔다.
스승이 작고한 이후에도 그는 나와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내가 일본서 큰 타이틀 매치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때면 찾아와 힘찬 응원을 해 줬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 1970년대 초 레슬링 경기를 끝내고 라커로 돌아왔는데 그가 들어와 "김일 선배님"하고 부른 후 시원한 맥주를 따라 줬다. 링에서 사투를 벌인 후 라커로 돌아오면 시원한 맥주를 한잔 마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맥주 한잔이면 경기 중 쌓인 피로가 확 가신다. 스포츠 종목이 다르지만 장훈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 경기 후 그가 따라 준 맥주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또 잊을 수 없는 맥주 맛이 있다. 1963년 9월 스승이 따라 준 맥주다. 이 맥주는 이승에서 받았던 스승의 마지막 술잔이었다. <계속>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나의 삶, 나의 도전] ‘박치기왕’ 김일 [65]
[나의 삶, 나의 도전] ‘박치기왕’ 김일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