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화 : 칠칠하지 못한 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나무라면서 핀잔을 주는 말로
“에이, 칠칠한 놈 같으니라고!” 아니면
“에이, 칠칠하지 못한 놈 같으니라고!” 했다면
어느 문장이 올바른 문장인가?
물론 뒤의 문장이 맞다.
그 이유는 ‘칠칠하다’의 뜻이 아래와 같으니까 말이다.
칠칠하다 - ①나무, 풀, 머리털 따위가 잘 자라서 알차고 길다. ②주접이 들 지 아니 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③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 다. ④터울이 잦지 아니하다.
곧, 위 풀이 ③의 뜻에 반하였기에 꾸지람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십진법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십(열)은 정상적이면서 완벽한 의미로 이해하고 그 아래 숫자인 칠(일곱)이나 팔(여덟)이 들어가는 단어는 뭔가 정상적인 것보다는 더 못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엄마 배속에서 열 달을 채 못 채우고 태어난 아이를 칠삭둥이나 팔삭둥이라고 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칠칠하다의 사용 예를 살펴보았다.
①의 경우 : 검고 칠칠한 머리
숲은 세월이 흐를수록 칠칠하고 무성해 졌다.
칠칠한 나물을 뜯으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②의 경우 : 칠칠치 못한 속옷 차림
③의 경우 : 칠칠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만큼 칠칠하고 일새 바른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용 예를 직접 살펴보아도 칠칠하다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문장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을 조금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어른들은 노상 ‘칠칠맞은 놈’이라고 나무랐기에 ‘칠칠하다’가 뭔가가 부족한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라는 인식이 우리 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노라니 갑자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의 내용 중에 ‘수필은 청자연적이다’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그리고 그 글은 이렇게 이어졌던가?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으로 된 것으로, 똑 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가 약간 꼬부라졌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 조각 연꽃잎을 옆으로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과연 그랬을까?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진 그 이유가 나에겐 여유가 없어서였을까?
무엇이든지 완벽을 추구하는 나의 편협한 의식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곡고화과(曲高和寡)라고 ‘곡이 높으면 화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왜 몰랐던가?
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는 이치를 왜 간과하였던가?
이제부터라도 나도 ‘칠칠하지 못한 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여유를 갖고 싶다.
한편, ‘안절부절’이 명사로 쓰이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으로 풀이되는데 ‘안절부절하다’와 ‘안절부절못하다’는 어떤 표현이 맞는가?
위 뜻풀이로만 보아서는 ‘안절부절하다’가 맞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안절부절못하다’가 맞다고 하니 우리말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절감한다.
안절부절못하다 :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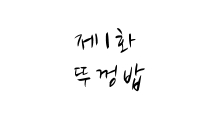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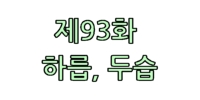 우리말을 찾아서(제93화 : 하릅, 두습 그리고 ……)
우리말을 찾아서(제93화 : 하릅, 두습 그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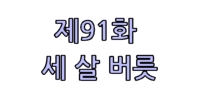 우리말을 찾아서(제91화 : 세 살 버릇 어쩐다고?)
우리말을 찾아서(제91화 : 세 살 버릇 어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