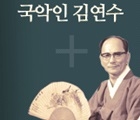1963년 9월 세계챔피언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처음으로 만난 한국인이 이춘성씨였다. 지금은 서울 영등포구 목화웨딩홀 회장인 그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나를 만난 것을 대단히 반기며 놀라워했다.
↑ 난 미국서 멸시와 차별를 받던 한국과 일본 교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 선수와 대결에선 젖먹던 힘을 다해 경기를 펼쳤다.
나도 미국에 와서 처음 알았다. 당시 미국 TV에선 일본에서 펼쳤진 레슬링 경기를 자주 방영했다. 나 자신도 내 경기가 미국 안방에 방영된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미국 선수들을 박치기 한 방으로 쓰러뜨린 것을 봤던 그는 나를 만나기 전부터 팬이 돼 있었다. 마음속 팬이었던 그 프로레슬링 선수가 눈앞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국인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그는 너무 기뻐하며 후견인을 자처했다.
귀공자 타입인 그는 대단히 겸손했고 신사였다. 그는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말하자면 나의 미국 매니저를 자처한 셈이다. 난 거절하지 않았다. 난 그에게 미스터 모터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
그는 LA 지리에 어두운 나를 위해 손수 차를 몰고 연습장과 숙소에 데려다 주곤 했다. 일본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프로레슬링 선수가 LA에 왔다는 소문은 교포들에게 순식간에 쫙 퍼졌다. 난 그의 손에 이끌려 한 교포의 집을 방문했다. 교포들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교포들은 한국의 다양한 요리를 준비 해 놓고 나를 반갑게 맞아 줬다.
그들은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모두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술이 몇 잔씩 돌아가자 <아리랑>과 <나의 살던 고향은> 등 고국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합창으로 불렀다. 내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미국 선수들을 이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교포들만 나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교포들도 나를 초대했다. 그들도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 주며 내가 선전해 줄 것을 기원했다. 난 한국과 일본 교포들로부터 동시에 초대받았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이국땅에서 겪는 설움은 똑같았다. 그들은 나를 통해 그 설움과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어 했다. 비록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해 일제 강점에 따른 민족적 감정이 쌓여 있었지만 미국에선 같은 동양인으로 서로가 돕고 협력해 가는 관계였다. 난 미국서 한국과 일본 교포들로부터 너무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 아마도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세계챔피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교포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수십 번 경기를 펼쳤다. 챔피언 도전 과정은 혹독했고 험난했다. 1963년 9월부터 12월 9일 세계 챔피언이 될 때까지 스물다섯 차례나 경기를 치렀을 정도다. 그렇지만 단 한 차례 졌을 뿐이다.
나의 경기 소식은 한국과 일본인 교포들 사이로 퍼지기 시작했다. 내가 경기를 하기 위해 링에 오르면 한국인과 일본인 수십 명씩 링사이드에서 “이겨라”를 외쳤다. 그들은 내가 미국인 선수를 박치기 한 방으로 자빠뜨리는 것을 그렇게 통쾌해 했다. 한국과 일본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췄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활약과 승리는 한국과 일본의 앙금과 갈등을 녹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
양 국민은 내가 승리하면 경기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다렸다. 그들은 동시에 나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 식사 자리에는 한국과 일본인이 함께 앉아 웃음꽃을 피웠다. 내가 경기를 하면 할수록 한국과 일본 교포들이 더욱 물 밀 듯이 몰려왔다. 5시간 이상 차를 몰고 경기장에 오는 것은 예사였다. 경기장에선 태국기와 일본기가 동시에 휘날렸다. 지금은 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진풍경이지만 어떤 때는 한국 교포들이 애국가를 부르면. 그 다음 일본 교포들이 국가인 기미가요를 불렀다.
드디어 12월 9일 세계챔피언 도전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계속>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