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바람을 기다리던 절벽, 대풍감
울릉도 북서쪽 끄트머리 태하리 해변에는 ‘대풍감(待風坎)’이 있다.
‘바람을 기다리는 절벽’이라는 뜻의 커다란 바위가 바닷쪽으로 삐죽 나와 있는 형태다.
울릉도에는 예로부터 배를 만들기에 알맞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아서 새로 배를 만들어 완성하면
대풍감에서 바위에 밧줄을 매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곳에서 세찬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돛이 휘어질 정도로 세찬 바람이 불면 한달음에 동해안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고 한다.
동력선이 개발되기 전에는 울릉도에서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대풍감에서 북서풍이 불기를 기다렸다.

2.전라도를 오가던 대풍감
조선시대 정부는 울릉도에 대해 ‘공도정책’ ‘쇄환정책’을 펼쳤다.
울릉도가 동해안에 들끓는 왜구들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우려해 섬 주민들을 아예 비워놓는 정책이었다.
조선정부는 2~3년에 한번씩 울릉도에 수토사를 파견해 수색하고, 일본인은 추방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아무도 살지 말라고 하는 울릉도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
1882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된 이규원은 울릉도에 조선인 140명, 일본인 78명이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선인 140명 중 115명이 전라도 출신이었다고 한다. 대부분 여수, 거문도, 고흥반도 인근에 살던
전라도 사람들로서 배 운항에 노련한 기술을 가진 뱃사람들이었다.
“전라도 사람들은 춘삼월 동남풍을 이용해 돛을 달고 울릉도에 가서 나무를 벌채하여 새로운 배를 만들고
여름내 미역을 채집해두었다가 가을철 하늬바람(북서풍)이 불면 목재와 해조류 그리고 고기를 가득 싣고
하늬바람에 돛을 달고 남하하면서 지나온 포구에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하면서 거문도로 귀향하였다.”
(전경수 ‘울릉도 오딧세이’)
울릉도는 개척령 이전부터 전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이른바 ‘나선’이라고 불리는 전라도 출신의 배가 천부 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오갔다고 한다.
이들은 봄에 남동풍이 불 때면 배 한 척에 타고 건너와 여름 동안 배를 건조하고 미역을 따고
고기를 잡아서 울릉도에서 건조한 배를 각자 한 척씩을 몰고 돌아갔다고 한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말, 대풍감에서 북서풍이 불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전라도에서 울릉도까지 해류와 바람의 힘으로 오갈 수 있었다.
울릉도에는 남쪽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쿠로시오해류(동한난류)가 있다.
봄에 이 해류를 타면, 남쪽에서 울릉도로 항해하기가 예상 외로 쉽다고 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절과 해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릉도에서 다이빙을 해보면 해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바로 울릉도 바닷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돔떼다.
원래는 제주 앞바다의 따뜻한 난류에 살고 있는 자리돔이 요즘에는 울릉도 앞바다에도 가득하다.
쿠로시오 해류, 동한난류를 타고 올라온 자리돔떼다.

3.울릉도내 전라도 방언
울릉도와 독도는 포항과 217km 떨어져 있는 동해의 외딴 섬이다. 주변 수심이 2000m가 넘는 심해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울릉도의 지명에는 예상 외로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도의 ‘보찰바위’다. ‘보찰’은 전라도 지역 사투리로 ‘거북손’을 뜻하는 말이다.
거북손은 남해안 지역에서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생물로, 무쳐서 먹으면 별미다.
울릉도민들도 ‘거북손’이라는 말보다는 ‘보찰’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사용한다.
나리분지에 있는 ‘알봉’ 안내문에도 ‘전라도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러 왔다가
알처럼 생긴 봉우리라고 해서 ’알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이 붙어 있다.
또한 울릉도 해변의 곳곳에도 전라도 방언으로 된 지명이 허다하다.
‘통구미’ ‘황토구미’ 등의 ‘-구미’는 전라도 방언으로 해안이 쑥 들어간 지형을 말한다.
항구로 이용할 수 있는 좁고 깊숙하게 들어간 만을 뜻하죠.
‘대풍감’의 ‘감(坎)’도 ‘-구미’를 한자어로 표현한 말로, 바닷가 절벽에 움푹 들어간 땅이라는 뜻이다.
현포는 원래 옛 이름이 ‘가문작지’였다. 전라도 방언으로 ‘-작지’는 자갈돌들이 널려 있는 해변가를 말한다.
‘검을 현(玄)’자를 쓰는 현포는 바닷물이 검게 보인다고 해서 ‘가문작지’(검은 자갈해변)로 불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와달’(작은 돌들이 널려 있는 긴 해안), ‘걸’(물고기나 수초가 모여 있는 넓적한 바닷속 바위)
‘독섬(돌섬)’ 등이 울릉도 지명에 남아 있는 전라도 방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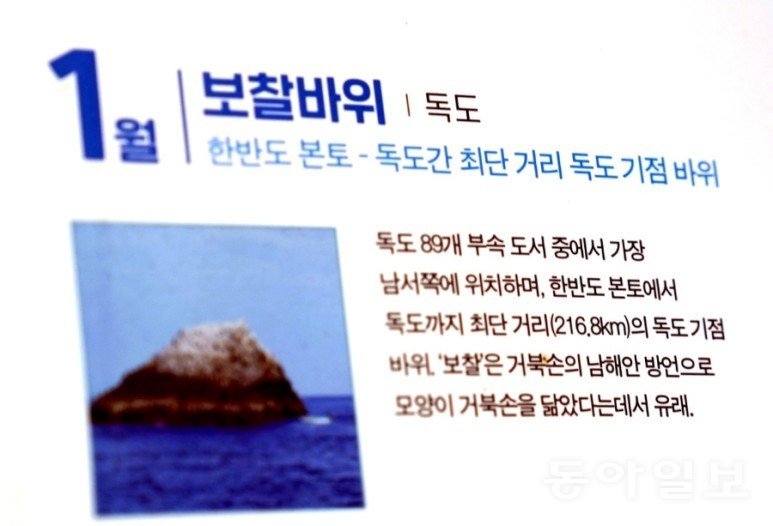
4.대한제국 칙령에 적힌 '석도'
그래서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도 전라도 방언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온다.
바로 석도(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한다고 밝힌 ‘대한제국칙령 41호(1900년 10월27일자)’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대한 내용이다. 칙령에는 울릉도의 관할구역을 ‘울릉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라고 했다.
전경수 서울대명예교수(인류학과)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바로 위의 대한제국칙령에서 명시한
‘석도’가 지금의 ‘독도’ 임을 증명하면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라도 방언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울릉도를 내왕했던 전라도 흥양 지방(여수, 거문도, 고흥반도 등)의 어부들이 불렀던
‘독섬’(돌섬의 전라도 방언)에 해답이 있다는 이야기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지금도 ‘돌’을 ‘독’이라고 부른다.
’독섬‘이라는 전라도 방언을 대한제국의 공문에서 한자로 ’석도‘(돌석+섬도)라고 적었다는 해석이다.
전 교수는 “우리가 요즘 부르는 ’독도(獨島)‘는 발음을 중심으로 지은 이름이고,
’석도‘는 의미 중심으로 지은 이름으로 같은 섬”이라고 말한다.
조선 정부는 섬을 비워놓는 공도정책을 펼쳤지만, 민초들은 매년 해류를 타고 배타고 섬을 찾아와
나무를 베고, 배를 만들고, 미역을 따서 바람을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먼 여행을 했다.
그 중요한 삶의 현장이 바로 ‘대풍감’이다.
동아일보(2024.2.11). 전승훈 기자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208/123454840/1
간혹, 울릉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고흥 사투리를 쓰는 걸 들을 수 있다.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신안산선 대부도연장 움직임과 고흥우주철도 거금도로 연장시나리오
신안산선 대부도연장 움직임과 고흥우주철도 거금도로 연장시나리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