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화 : 쌀을 판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아직도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가 의문인 것 중 하나가 ‘쌀을 판다’이었다.
왜 돈을 주고 쌀을 사는데도 ‘쌀을 판다’고 했을까?
(이런 현상은 쌀이나 보리, 콩 등 일부 몇 가지 곡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채소 등 다른 농산물에는 잘 사용되지 않음)
나도 이 점이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즉. 쌀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대지주인 양반들인데 상인을 천시 여기는 이들이 상인처럼 쌀을 판다고 할 수 없어 반대로 산다고 했다는 설,
쌀을 사야만 하는 가난을 조상들에게 안 보여주기 위하여 판다고 했다는 설,
곡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반어적으로 사용된 관습어다는 등 등 등.
이 모든 설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으나 나의 능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단지 ‘사다’라는 단어의 뜻이 아래와 같이 ‘가진 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만 새로이 알았을 뿐.
사다 : ①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
②가진 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다.
(‘사다’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많으나 주제와 관련된 것만 발췌함) 통상적으로 ‘사다’라는 것은 위 뜻①과 같이 「(돈으로)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우리에게 뜻②는 뜻밖이었다.
이 뜻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하면
예전, 화폐가 통용되기 전의 모든 거래는 물물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때에는 ‘사다’라는 개념과 ‘팔다’라는 개념이 없고 ‘바꾸다’라는 개념만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거래의 매개체인 화폐(돈)가 등장하고부터는 ‘돈’이라는 개념과 ‘값’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지만 화폐(돈)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자기가 생산한 쌀이나 기타 곡물을 화폐 대신 사용하였을 것인데 그 농민이 사용한 것이 쌀 등 기타 곡물이었을 것이다.
한편 ‘돈’이라는 것은 요즈음에는 엄격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폐나 동전으로 발권된 것을 의미하지만, 예전에는 맞교환할 물건 그 자체를 ‘돈’이라고도 했던 것 같다.(믿거나 말거나이다)
그럼 ‘팔다’에도 우리가 모르는 뜻이 숨어 있을까?
팔다 : ①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기거나 노력 따위를 제 공하다. ②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팔다’라는 단어도 다른 뜻이 많으나 주제와 관련된 것만 발췌함)
새로 알게 된 뜻②가 오늘의 의문을 해결해 주었다.
즉, ‘팔다’라는 단어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사는 것」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쌀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콩팔칠팔 따지지 말고 쌀의 의미만 짚어보고 이야기를 마치자.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의 ‘쌀’은 단순히 밥(음식)을 해 먹는 여러 가지 곡물 중의 하나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식이다. 즉, 부의 크기를 의미하는 천석꾼이나 만석꾼은 일 년에 쌀을 거두어들이는 량을 나타낸 말이며, ‘독이 비었다’에서의 ‘독’은 ‘쌀독’을 의미하며 그 ‘쌀독이 비었다’는 것은 곧 가난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보릿고개나 피고개를 어렵게 넘어온 우리네가 가을에 수확한 벼를 찧어 쌀독에 가득히 채워 놓으면 왜 그리도 마음이 풍족했는고!
우리 금산에서 벼농사를 짓지 아니한 가정에서는 초겨울의 뻘벳김 해우를 팔면 제일 먼저 장만한 것도 쌀이었으니 쌀은 바로 우리의 생명 그것이었으리라.
요즈음에는 필요에 따라 Kg 단위로 포대에 담겨있는 쌀을 그때그때 사서(팔아서) 먹지만 예전에는 싸전에서 말이나 되로 사서(팔아서) 먹었다.
싸전 주인이 말질이나 되질을 할 때, 인심이 후한 사람이라면 조금 고봉(高捧)으로 할 터이지만, 대부분의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깨끼로 할 것이 분명할 터.
그래서 말질이나 되질을 할 때 정확한 량을 재기 위하여 만든 기구가 있으니 그게 바로 ‘평(平)미레’라고 한다.
또한 정확한 량을 잰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에게 모두 공평한 것이니, 그렇게 하는 의미의 ‘평(平)미리치다’를 함께 소개한다.
콩팔칠팔 - ①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마구 지껄이는 모양. ②하찮은 일을 가지고 시비조로 캐묻고 따지는 모양.
평(平)미레 - 말이나 되에 곡식을 담고 그 위를 평평하게 밀어 고르게 하는데 쓰는 방망이 모양의 기구.
평(平)미리치다 - 고르게 하다. 또는 평등하게 하다.
깨끼 -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에, 수북이 담지 않고 전과 수평으로 담는 방법.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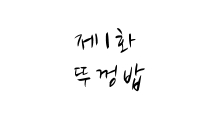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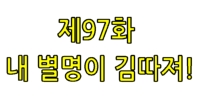 우리말을 찾아서(제97화 : 내 별명이 ‘김따져!’)
우리말을 찾아서(제97화 : 내 별명이 ‘김따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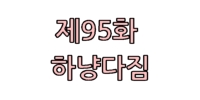 우리말을 찾아서(제95화 : 노우, 프로블렘!)
우리말을 찾아서(제95화 : 노우, 프로블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