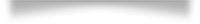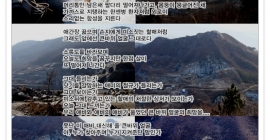지붕 끝에 앉아 있는 저 비둘기는 항상 남쪽만을 바라보며 날라가지도 않은 채,
서른해가 넘는 내 나이 만큼이나 그 세월 그 시간동안 우리집을 변함없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당이 넓지도 그렇다고 깊지도 얕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시사철 시간이 흘러가듯 담장밑에 심어 둔 다래나무 감나무 밀감나무 들이 제 빛을 찾아가는 맛을 느낄 뿐입니다.
정재에 있어야 할 솥단지가 신식 주방에 밀려 이젠 초라하게 마당 한켠을 차지하고 소밥과 개밥을 삶는데 그 쓰임을 다하고 있고,
널부러져 있는 마당의 물건들도 내눈에는 그저 조화롭게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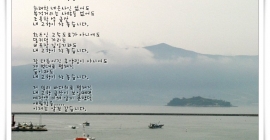 내고향 금산이 참 좋습니다.
내고향 금산이 참 좋습니다.
 거금도 야생화 모음
거금도 야생화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