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화 : 워낭소리
82세의 나이에도 30여년을 동고동락하다가 40세의 나이로 죽은 소의 무덤을 날마다 한 번씩 찾으신다는 (지난 2009년 초에 개봉되어 300만의 관객을 극장가로 끌어드려 전국을 강타한 7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의 주인공인) 최원균 옹께서 구제역 방역비에 보태라고 100만 원의 성금을 내셨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일이며, 초기에 고열(40∼41℃)이 있고, 사료를 잘 먹지 않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잘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구내염과 제관(蹄冠)·지간(趾間)에 수포가 생기면서 앓다가 죽는다.」는 구제역(口蹄疫)은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만일 이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염된 소와 접촉된 모든 소를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한다는데 빨리 소멸되어 전국의 사육농가가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각설하고.
글 제목인 ‘워낭소리’에서 ‘워낭’이란 무엇인가?
국어대사전에서는 「마소의 귀에서 턱 밑으로 늘여 단 방울. 또는 마소의 턱 아래에 늘어뜨린 쇠고리.」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 풀이만 가지고는 딱 ‘이것이다’라고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연상된 것이 소 멍에의 양끝에다 다는 ‘쇠풍경(-風磬)’이다.
풍경(風磬)은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속에는 붕어 모양의 쇳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라고 국어대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데 그런 풍경의 종류로는 산사(山寺) 지붕 밑에 달려있는 풍경과 상여 소리꾼이나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풍경,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소의 양쪽 귀 옆에 달아주는 풍경(이것이 쇠풍경이다) 등이 있다.
우리는 자라면서 워낭을 풍경(사투리로 핑경)이라고만 불렀기에 그 단어가 낯설어서 얼른 감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또 ‘소리’는 무엇인가?
다 알다시피 국어대사전에서는 ‘소리’의 뜻을 아래와 같이 풀이하고 있다.
①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리어 귀에 들리는 것.
②이하는 생략함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매일매일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소리와 지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듯한 태풍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도시의 자동차 등의 소음은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
반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낙비 소리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얼음 밑에서 들리는 시냇물의 졸졸졸 흐르는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는 우리의 심신을 청량하게 해 준다. 또한 대나무 숲의 사운거림(조정래 선생님께서 대하소설 ‘아리랑’에서 대나무 잎들이 서로 비벼대며 내는 소리를 ‘사운거리다’라고 표현하셨음)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 주며, 연인들의 밀어를 방해하는 바닷물의 미닥질 소리는 그네들의 사랑을 여물게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나의 경우) 새벽까지 곤히 잠든 아내의 숨 쉬는 소리와 그 새벽을 깨우는 교회의 종소리는 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와 아침저녁으로 들려오는 사찰의 은은한 종소리는 나를 뒤돌아보게 한다. 또한 서편제의 애절한 정한은 나를 눈물짓게도 하지만, 용궁에서 도망쳐 나온 토끼의 무용담은 나를 웃음 짓게 한다.
그리고 깔깔거리며 웃는 어린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는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소와 함께 보내셨던 최원균 할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소의 워낭소리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정겨웠을 터.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을까?
신명나는 사물패의 꽹과리 소리도 듣고 싶고, 명인이 뜯는 거문고 소리도 듣고 싶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듣고 싶은 소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위하여 ‘따르릉’ 하고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소리와 그 상담을 끝내고 듣는 ‘고맙습니다!’이다.
하지만하지만 그 소리들보다 더 애타게 듣고 싶은 소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녹슨 피리(無笛)에서 울려나올 청아한 피리소리인데
그 소리는 언제나 들을 수 있을꼬!
(‘無笛’은 「(잘못 만들어져) 소리가 나지 않은 피리」라는 의미로, 그 피리에서 청아한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정진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표현한 나의 필명이자 아호다.)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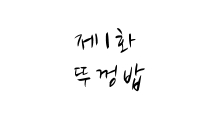












 제76화 : 피에로와 각설이
제76화 : 피에로와 각설이
 제74화 : 장맞이
제74화 : 장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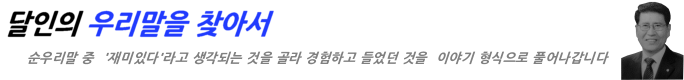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에는 나를 '무적'보다는 '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에 대하여
우리말 달인이 아닌 세무의 달인(?)이라고 애둘러 변명하지만
우리말 달인이 못된 게 못내 아쉽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