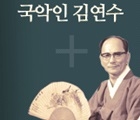스승은 레슬링을 통해서 남북 통일에 기여하고 싶어했다. 실제로 스승은 레슬링을 통해 남북이 하나되는 프로젝트를 구상중이었다. 스승은 가끔 내게 "남과 북이 하나되고 화해를 하기 위해 남북한에서 레슬링을 개최하면 어때?"라고 의향을 묻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난 스승에게 "실현만 된다면 최고의 빅이벤트가 될 것입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던 기억이 있다.
스승이 구상중인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남한에서 경기를 펼치고, 또 이북에서도 경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한의 챔피언과 북한의 챔피언이 남과 북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 챔피언이 일본의 챔피언과도 맞붙는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스승은 남·북한에서 경기를 하기에 앞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문했다. "무조건 실력을 키워라.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라." 난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죽어라고 연습했고, 링에 올랐다. 나의 프로레슬링은 1960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1961년 이후 연승행진은 끝이 없었다. 나의 트레이드 마크 박치기는 팬들에게 완전히 각인 시켰다.
안토니오 이노키와의 대결은 늘 흥미진진했는데 1962년 안토니오 이노키와 열 다섯차례 맞붙었지만 한번도 패하지 않았다. 또 1963년에는 14차례 경기를 벌였지만 이 역시 한번도 패하지 않았다. 사실 레슬링에서 승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이노키에게 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레슬링이 강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본서 나의 레슬링이 만개하면서 스승은 이제 일본을 뛰어 넘어 세계로 향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을 불러 들여 주요 경기에 나를 출전시켰다. 난 처음 외국인 선수와 맞붙을 때 힘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혹독한 훈련이 효과를 냈다. 외국인 선수와 맞붙는데도 밀리지 않고 압승을 거뒀다.
스승은 내가 빨리 국제적 레슬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랐다. 앞서도 말했지만 스승은 남북한 프로레슬링 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스승이 그런 말을 하면 할 수록 나도 흥분됐다. 속으로 이북이 고향인 스승과 남한이 고향인 내가 남북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하면 괜히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졌다.
나아가 스승은 제자중 한명을 우선적으로 세계챔피언 벨트를 차게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제자들도 이런 스승의 원대한 뜻을 알고 열심히 훈련했다. 스승이 강조하는 것은 실력이 없으면 결코 세계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승은 첫째도 실력, 둘째도 실력을 강조했다. 스승은 실력있는 제자에게 세계챔피언 도전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 기회가 내게 먼저 찾아온 것 같다. 1963년 8월로 기억된다. 스승은 느닷없이 "너 외국에서 경기 한번 하고 올래"라고 물었다. 그때까지 난 일본서 링에 오르는 것도 행복했다. 외국이란 말에 귀가 솔깃했다. 스승이 말한 외국은 미국이었다.
스승은 "자고로 레슬러는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떨쳐야 한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다. 스승은 미국에 가면 일본의 챔피언도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받으면 세계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난 스승이 그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날 나를 불렀다. "너 오늘 저녁 나와 술 한잔 하자"라고 했다. 스승의 입에서 나와 단둘이 술 한잔하자고 말하는 것은 제자가 된 이후 처음 듣는 소리였다. 난 스승이 왜 술을 한잔 하자고 했는지 무척 궁금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술잔이 이승의 마지막이었으니…. <계속>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나의 삶, 나의 도전] ‘박치기왕’ 김일 [70]
[나의 삶, 나의 도전] ‘박치기왕’ 김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