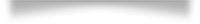출처 : http://hanulan.or.kr/05dado/dd247.html
연 꽃 차 설타원 전명진 교무 서초교당 / 설명예다원(雪茗禮茶苑) 원장 / 다도교수 동다송칠송(東茶頌七頌)에 “여름에 왕성하고 겨울에 버림은 차 마심이 아니다”라고 했다. 초복 중복 소서 대서가 있는 이 달 7월의 차화(茶花)는 누가 뭐라 해도 능소화를 으뜸으로 칠 것이다. 찻상에 능소화 낙화 몇 송이 흩어놓고 초록빛 연잎을 차사발 밑에 깔고서 잘 우러난 따뜻한 차 한 잔 마신다면 얼마나 운치 있는 여름날의 차 자리가 될 것인가? 엄선된 규율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실내로 끌어 들여보면 아름답고 격조 있는 차실이 되리라 싶다. 중국의 부생육기(浮生六記)에 나오는 ‘운이(雲)’의 연꽃차를 이 여름에 연상해 본다. 아침에 이슬 먹고 갓 피어난 연꽃 한 송이 꺾어 향기로운 연차(連茶)를 만들어 사랑스런 남편에게 바친 그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는 요즘날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인(茶人)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연꽃은 여름날 우리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좋은 약재이며 음식이다.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으로 옛날에는 이 꽃을 도덕화(道德花), 수도화라고도 했다. 왜냐하면 진흙에 뿌리내리고 살지만 그 자태는 진흙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연꽃은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그 꽃잎을 오므린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차를 넣고 묶어놓든지 아니면 꽃이 오므라지기를 기다려 하룻밤을 지내면 연꽃의 향기가 차(茶) 속에 스며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연꽃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거기에 싱그러운 맛을 더하려면 탕관 속에 연의 줄기를 썰어서 넣어보면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차로 우러나게 된다. 또 9월에 나는 연잎으로 감잎차를 만들거나 연잎차를 만들기도 하고 여린 연잎으로 찰밥을 갖은 재료 넣어서 싸서 창포잎으로 동여매면 좋은 약밥이 되기도 하며 소주와 토종꿀을 뜨고 난 봉밀을 함께 넣어서 밀봉해 그늘에 두면 연엽주가 만들어진다. 또 연근은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다식을 만들기도 하며 연꽃이 피고 난 후 맺히는 열매인 연자(連子)는 연자육(連子肉)이라 하여 심장이 허한 분이나 신경과민으로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에게는 안정을 시켜주는 좋은 약재이기도 하다. 이 연자육을 갈아서 죽을 쑤기도 하고 또한 가루차와 같이 섞어서 마시면 부드럽고 연한 말차(抹茶)가 만들어진다. 우리의 전통 여름나기에는 유난히 음식으로 건강을 살피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열치열(以熱治熱)로 건강을 살피고 기운을 북돋는 건강차들이 연구만 하면 많이 있다. 뜨거운 차 한잔으로 더위를 달래는 피서법으로 차나 한 잔 마셔 보자. 출처 : http://www.pubpo.com/news/573/sub7/573g09.htm 연꽃이 아침이면 피고 저녁이 되면 꽃송이가 오므라드는 특성을 활용해 차를 만든 사람이 있다. ‘여름에 연꽃이 처음 필 때, 꽃들이 저녁이면 오므라들고 아침이면 피어난다. 운이는 작은 비단주머니에 잎차를 조금 싸서 저녁에 화심(花心)에 넣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샘물에 끓여 차를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 차는 향기가 유난히 좋았다.’ 임어당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찬탄한 《부생육기》의 운(芸)이 연꽃차를 만드는 모습이다. 《부생육기》는 심복이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책인데, 심복이 아내인 운이와의 삶을 적은 것 중에 한 부분이다. 해질녘 운이가 연밭으로 가서 막 꽃잎을 접으려는 꽃송이를 살며시 열고 조심스럽게 비단주머니에 싼 차를 넣어두었다가, 이튿날 아침 꽃잎이 반쯤 피었을 때, 꽃잎이 다치지 않게 살며시 차를 꺼내는 모습이 선연하다. 중국에서 꽃차의 등장은 명나라 때부터이다. 원나라 때부터 시작된 잎차가 명나라에 와서 성행하면서 꽃차도 등장한다. 잎차의 발달과 그 궤를 함께 한다. 명나라 때 고원경(顧元慶)이 쓴 《운림유사(雲林遺事)》에 연꽃차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연못 늪 가운데로 간다. 아침을 먹기 전 해가 처음 떠오를 때, 연꽃이 약간 벙근 것을 골라 손가락으로 꽃송이를 벌리고, 꽃 속에 차를 가득 넣은 다음 삼 껍질로 묶어 하룻밤 묵힌다. 다음날 일찍 연꽃을 따서 차를 쏟아낸다. 종이에 싸서 불에 쬐어 말린다. 이러한 과정을 3번 반복하여 주석 통에 담고 입 부분을 묶어 저장을 한다.’ 운이의 연꽃차와 《운림유사》의 연꽃차는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운이는 꽃에 차를 넣을 때 해거름에 넣어 하룻밤 동안 넣어 두었고, 《운림유사》에서는 이른 아침에 넣어 만 하루 동안을 꽃 속에 두었다. 아침에 차를 넣었기 때문에 꽃송이가 벙그므로 삼 껍질로 꽃 봉우리를 묶었고, 운이는 저녁에 화심에 넣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했을 것이다. 《운림유사》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꽃송이를 옮겨가며 3번 반복해서 차에 연꽃의 향기를 스며들게 했다. 연꽃의 향기가 엷기 때문에 여러 꽃송이에 반복하여 차를 넣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운이의 연꽃차는 한 번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심복이 생략을 했거나, 운이가 세상을 뜬 후 《부생육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꽃차가 생산된다. 그러나, 연꽃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만드는 방법도 다른 차와 달라 대중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연꽃차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곳의 연밭을 찾아 다녔다. 대부분은 홍련이 있는 곳이었고, 백련이 핀 곳도 드물지만 있었다. |

 육화탑
육화탑
 법정스님
법정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