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죽 이야기
여름 방학 때 집에 오면 엄마는 우리에게 곧잘 팥죽을 쑤어 주셨다. 형과 나, 그리고 동생은 서로 많이 먹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많이먹기 시합이라도 하듯 그 팥죽을 서너 그릇 이상씩을 먹어치우곤 했는데 엄마는 맛있게 잘
먹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속으로 흐믓하셨을 게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우리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집에서도 팥죽을 자주 써서 먹곤 하였다.
밀가루를 적당한 량의 물에 잘 반죽하여 마른빨래 두들기는 방망이로 반듯하게 밀어 촘촘히 가늘게 썰어서 팥을
삶아 고운 물에 넣어서 귀한 자식들 맛있게 먹으라고 정성을 다하여 끊여 주신 그 팥죽 맛이란!
배고픈 아이가 힘차게 빨아 먹었던 엄마의 젖이 그만큼 맛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맛있는 팥죽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밖으로 마실 나간다.
바닷가 갱본에는 그만 그만한 또래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다.
아! 한 참 막 크는 그 나이 때는 ‘밥 먹던 수저를 놓고 돌아만 앉아도 배가 또 고프다’고 했던가.
밤이 깊어지면 아까 먹었던 팥죽이 벌써 소화가 되었는지 슬슬 야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팥죽을 썼던 집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간다. 누구네 집은 어떻고, 누구네 집은 안 되고.
오늘은 누구네 집으로 가자.
이렇게 모의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가 지정한 집의 장독대를 뒤진다.
역시 거기에는 한 양판의 팥죽이 적당히 식어 있다.
서로가 어려운 시절.
배고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준비해 둔 우리 쇠머리의 인심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쫀밴 낶기
우리 쇠머리 사람들은 초,중학생 때는 갓낶기와 문저리 낶기를 주로 했고, 조금 더 크면 어른들을 따라 쫀밴
낵기를 하게 된다. 물론 밤에는 장어 낶기도 하였고.
지금은 쫀밴라는 고기는 자취를 찾아 볼 수도 없이 귀해져 버렸지만 당시만 해도(여름철에는) 먹섬 주위에는
늘 쫀밴 낶기하는 배가 많이 떠 있었다. 한 번 나갔다 하면 적게는 3~4십 마리, 많게는 백여 마리를 잡아오곤
하였다.
그 고기는 맛이 담백하여 횟감으로도 인기가 좋았으나 배를 갈라 적당히 말려 구워서 먹는 맛이 일품이었다.
10마리를 한 뭇이라고 하였는데 누구에게든지 얼마나 잡았는냐 하고 물으면 한 너댓뭇 잡았네 하는 대답이
거의 통용화 될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왜 그 많던 고기가 멸종이 되다시피 하였는지 참 모를 일이다.
진몰 문백이가 쫀밴 낶기가서 낚시를 바다에 넣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
“용왕님, 문백이 술 들어가요, 쫀밴가 봄날에 삐비 뽑듯이만 올라오게 해 주시요잉.”
지금은 거의 모두가 릴낚시로 감성동이나 농어 등을 낚고 있으니 참 세월의 변화가 무상하다.
꿩 약 이야기
겨울은 야생동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배 고픈 계절인 듯 하다.
먹을 것이 귀한 때라 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민가 가까운 산으로 내려오기 마련이고.
그 시절에는 콩에다가 싸이나같은 독극물을 넣어 꿩이 다니는 길목에 놓았다가 그것을 먹고 죽은 꿩을 잡아다
먹는 일이 흔하였다. 지금은 꿩대신 닭인데 당시에는 닭 대신 꿩이었나 보다.
그 과정은 이렇다.
먼저 씨알이 굵은 두부콩을 준비한다.
다음에 끝이 둥그러우면서면 날까로운 기구로 준비한 콩의 속살을 파 낸다.
속살을 파낸 콩에다가 적당량의 싸이나를 넣고 맨 나중에 양초로 봉한다.
그런게 만든 것을 꿩약이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꿩약을 꿩이 잘 다닐만한 산 속에 놓아둔다.
이 때 다음 날 꿩이 그 약을 먹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산속이라 그 장소가 불분명하기에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꿩약을 놓은 자리에 벼 등겨를 깔아 놓는다.
다음 날 확인결과 꿩약이 없어 졌으면 그 부근 어디엔가에는 틀림없이 꿩이 죽어 있다.
궝약이 없어 졌는데도 죽은 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꿩은 이미 다른 사람이 주어가서 먹어 버린 다음이다.
나도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은 꿩 한 마리를 주운 일이 있는데 그 때는 나무고 뭐고 생각할 것 없이 빨리 집
에 와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러한 꿩약에 얽힌 웃기는 이야기 한마디.
차용 성이 열심히 꿩약을 만들고 있다. 옆에는 여동생인 차순이가 정신없이 놀고 있다가 콩을 하나 집어 먹은
모양이다. 아니 그런데 오빠가 콩 속에다가 뭐 이상한 것을 넣는다. 오빠. 그게 뭐야? 응. 이 것을 먹으면 꿩이
죽은단다. 갑자기 차순이가 놀라서 말한다. “오빠야, 오빠야, 나는 죽었다.” 오빠가 “왜”하고 물으니 “꿩약 하나
먹었으니 나는 죽었다.”
차순이도 그 나이에 삶과 죽음을 알았던 모양이다.
오! 불쌍한 우리 차순이. 그 때 알마나 놀랐을까?
한 겨울의 해삼잡기
한 겨울의 쇠머리는 해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바쁜 나날이지만 날씨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가 오면 해우를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바다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날들
은 날마다의 일에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날인 것이다. 그런 날엔 끼리끼리 모여서 화투도 치고 술
도 마시며 놀았으니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행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해삼잡기이다.
여덟물 내지 아홉물 때가 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해우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바로 그 물때가 되면 우리는 어김
없이 따순기미로 해삼을 잡으러 간다. 일년이면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행사이므로 가기만 하면 해삼은 많이 잡
을 수 있다.
이따가 갈아입을 두툼한 옥과 적당히 마실 술과 초장만 준비해 가면 된다. 이따가 몸을 말릴 불을 지필 나무는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한 끝이 뾰쪽한 쇠꼬챙이를 들고 물이 가슴께까지 차는 바다속으로 양말만 신은 맨발로 들어가 발의
감촉으로 해삼을 식별해 낸다. 발끝에 물컹하고 해삼이 밟히면 들고 있는 쇠꼬챙이로 해삼을 찔러서 건져 낸다.
가장 멀리까지 나갔던 물이 다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 그 때까지 잡은 해
삼이 가지고 간 바구니에 가득하다.
물 밖에는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기다린다.
그렇게 잡은 해삼을 안주삼아 우리는 아주 맛있게 술에 취할 수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스탄트식품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의 그러한
행사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아주 이상한 행동으로나 비추이지 않은지.
여름 방학 때 집에 오면 엄마는 우리에게 곧잘 팥죽을 쑤어 주셨다. 형과 나, 그리고 동생은 서로 많이 먹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많이먹기 시합이라도 하듯 그 팥죽을 서너 그릇 이상씩을 먹어치우곤 했는데 엄마는 맛있게 잘
먹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속으로 흐믓하셨을 게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우리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집에서도 팥죽을 자주 써서 먹곤 하였다.
밀가루를 적당한 량의 물에 잘 반죽하여 마른빨래 두들기는 방망이로 반듯하게 밀어 촘촘히 가늘게 썰어서 팥을
삶아 고운 물에 넣어서 귀한 자식들 맛있게 먹으라고 정성을 다하여 끊여 주신 그 팥죽 맛이란!
배고픈 아이가 힘차게 빨아 먹었던 엄마의 젖이 그만큼 맛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맛있는 팥죽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밖으로 마실 나간다.
바닷가 갱본에는 그만 그만한 또래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다.
아! 한 참 막 크는 그 나이 때는 ‘밥 먹던 수저를 놓고 돌아만 앉아도 배가 또 고프다’고 했던가.
밤이 깊어지면 아까 먹었던 팥죽이 벌써 소화가 되었는지 슬슬 야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팥죽을 썼던 집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간다. 누구네 집은 어떻고, 누구네 집은 안 되고.
오늘은 누구네 집으로 가자.
이렇게 모의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가 지정한 집의 장독대를 뒤진다.
역시 거기에는 한 양판의 팥죽이 적당히 식어 있다.
서로가 어려운 시절.
배고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준비해 둔 우리 쇠머리의 인심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쫀밴 낶기
우리 쇠머리 사람들은 초,중학생 때는 갓낶기와 문저리 낶기를 주로 했고, 조금 더 크면 어른들을 따라 쫀밴
낵기를 하게 된다. 물론 밤에는 장어 낶기도 하였고.
지금은 쫀밴라는 고기는 자취를 찾아 볼 수도 없이 귀해져 버렸지만 당시만 해도(여름철에는) 먹섬 주위에는
늘 쫀밴 낶기하는 배가 많이 떠 있었다. 한 번 나갔다 하면 적게는 3~4십 마리, 많게는 백여 마리를 잡아오곤
하였다.
그 고기는 맛이 담백하여 횟감으로도 인기가 좋았으나 배를 갈라 적당히 말려 구워서 먹는 맛이 일품이었다.
10마리를 한 뭇이라고 하였는데 누구에게든지 얼마나 잡았는냐 하고 물으면 한 너댓뭇 잡았네 하는 대답이
거의 통용화 될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왜 그 많던 고기가 멸종이 되다시피 하였는지 참 모를 일이다.
진몰 문백이가 쫀밴 낶기가서 낚시를 바다에 넣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
“용왕님, 문백이 술 들어가요, 쫀밴가 봄날에 삐비 뽑듯이만 올라오게 해 주시요잉.”
지금은 거의 모두가 릴낚시로 감성동이나 농어 등을 낚고 있으니 참 세월의 변화가 무상하다.
꿩 약 이야기
겨울은 야생동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배 고픈 계절인 듯 하다.
먹을 것이 귀한 때라 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민가 가까운 산으로 내려오기 마련이고.
그 시절에는 콩에다가 싸이나같은 독극물을 넣어 꿩이 다니는 길목에 놓았다가 그것을 먹고 죽은 꿩을 잡아다
먹는 일이 흔하였다. 지금은 꿩대신 닭인데 당시에는 닭 대신 꿩이었나 보다.
그 과정은 이렇다.
먼저 씨알이 굵은 두부콩을 준비한다.
다음에 끝이 둥그러우면서면 날까로운 기구로 준비한 콩의 속살을 파 낸다.
속살을 파낸 콩에다가 적당량의 싸이나를 넣고 맨 나중에 양초로 봉한다.
그런게 만든 것을 꿩약이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꿩약을 꿩이 잘 다닐만한 산 속에 놓아둔다.
이 때 다음 날 꿩이 그 약을 먹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산속이라 그 장소가 불분명하기에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꿩약을 놓은 자리에 벼 등겨를 깔아 놓는다.
다음 날 확인결과 꿩약이 없어 졌으면 그 부근 어디엔가에는 틀림없이 꿩이 죽어 있다.
궝약이 없어 졌는데도 죽은 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꿩은 이미 다른 사람이 주어가서 먹어 버린 다음이다.
나도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은 꿩 한 마리를 주운 일이 있는데 그 때는 나무고 뭐고 생각할 것 없이 빨리 집
에 와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러한 꿩약에 얽힌 웃기는 이야기 한마디.
차용 성이 열심히 꿩약을 만들고 있다. 옆에는 여동생인 차순이가 정신없이 놀고 있다가 콩을 하나 집어 먹은
모양이다. 아니 그런데 오빠가 콩 속에다가 뭐 이상한 것을 넣는다. 오빠. 그게 뭐야? 응. 이 것을 먹으면 꿩이
죽은단다. 갑자기 차순이가 놀라서 말한다. “오빠야, 오빠야, 나는 죽었다.” 오빠가 “왜”하고 물으니 “꿩약 하나
먹었으니 나는 죽었다.”
차순이도 그 나이에 삶과 죽음을 알았던 모양이다.
오! 불쌍한 우리 차순이. 그 때 알마나 놀랐을까?
한 겨울의 해삼잡기
한 겨울의 쇠머리는 해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바쁜 나날이지만 날씨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가 오면 해우를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바다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날들
은 날마다의 일에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날인 것이다. 그런 날엔 끼리끼리 모여서 화투도 치고 술
도 마시며 놀았으니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행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해삼잡기이다.
여덟물 내지 아홉물 때가 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해우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바로 그 물때가 되면 우리는 어김
없이 따순기미로 해삼을 잡으러 간다. 일년이면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행사이므로 가기만 하면 해삼은 많이 잡
을 수 있다.
이따가 갈아입을 두툼한 옥과 적당히 마실 술과 초장만 준비해 가면 된다. 이따가 몸을 말릴 불을 지필 나무는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한 끝이 뾰쪽한 쇠꼬챙이를 들고 물이 가슴께까지 차는 바다속으로 양말만 신은 맨발로 들어가 발의
감촉으로 해삼을 식별해 낸다. 발끝에 물컹하고 해삼이 밟히면 들고 있는 쇠꼬챙이로 해삼을 찔러서 건져 낸다.
가장 멀리까지 나갔던 물이 다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 그 때까지 잡은 해
삼이 가지고 간 바구니에 가득하다.
물 밖에는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기다린다.
그렇게 잡은 해삼을 안주삼아 우리는 아주 맛있게 술에 취할 수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스탄트식품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의 그러한
행사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아주 이상한 행동으로나 비추이지 않은지.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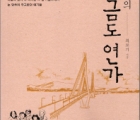
혹시 내일 올 수 있으면 와서
모래는 이 앞 일요일에 못 간 산까지 해서 곱으로 가야하고
(내일 서울에서 잡혀 버리면 또 산행은 못 하겠지만)
해서 숨가쁘게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