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이른 아침 호미를 챙겨 나가시며 엄마는 잊지 않고 당부하신다
'아야~학교 끝나면 국수 한주먹 삶아 내 오그라잉~~"
'에이~~씨..맨날 나만 시켜!'"
그러거나 말거나 대꾸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서두르시는 엄마 뒷통수에 대고
눈을 째리며 앙탈을 부리지만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기에
속으론 내심 포기를 하고 말았다
유난히 게으른 성격이던 나는 그래서 늘 엄마에게 야단을 맞아야 했고
그런 엄마가 미워서 매일 입이 뚱하게 나와 미운 짓만 골라서 했던 것 같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은 바닷가에 모여 조개를 줍고
바위에 엎드려 수다를 떨고 커다란 구멍이 난 바위틈에서 흐르는 시원한 물에
멱을 감거나 술레잡기를 할 생각에 신바람이 나서 바다로 내 달렸지만
나는 아침에 남긴 엄마의 당부가 귀에 박혀 그들속에 낄 수가 없었다
양은솥에 물을 끓여 국수를 넣고 휘휘 저어 바구니에 담아 우물가로 향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국수를 씻은 다음 작은 바구니에 담고 설탕 탄 물주전자 들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터라 허기져 계실 엄마를 생각하며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난 어린 나이에도 머리에 무엇을 이고 가는 것이 유난스레 싫고 창피했다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짐도 머리에 절대로 이어 본적이 없었는데
키는 왜 훌쩍 자라질 못했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밭까지 가는 길이 어찌나 먼지 아마 족히 1시간을 걸어야 했을 것이다
신작로를 지나 윗마을 언덕을 지나고
무덤이 군데군데 모여있는 산모퉁이를 한참을 지나야 엄마가 계신 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산을 일궈 만든 밭이어서 워낙 끝도 보이지 않을만큼 넓어 두리번 거리며 찾았지만
엄마 모습이 금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도 언덕 너머까지 올라가신 모양이다
재잘거리는 산새소리.간간히 바람에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흠짓 놀랄만큼 새삼스럽고 무섬증마저 든다
'엄마!!'나 왔어~~!' 투정섞인 소리를 냅다 지르며 부르자
'아이`~나 여기있다 더 올라 오느라`~"엄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밭으로 오르는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증조 할아버지 산소를 곁눈질하며
부지런히 밭이랑을 올랐다
드디어 저만치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고구마 밭을 매고 계시는 엄마의 등이 보였다
작고 외소한 뒷모습이 산처럼 크게 느껴졌지만
반가움반 원망반으로 일부러 털썩 소리가 나도록 새참 바구니를 내려 놓았다
땡볕에 그을리다 못해 벌겋게 익은 얼굴만 돌리시고
'거기 두고 기다려라 이 고랑만 다 매고 묵자'하신다
'아이~~지금 먹어`~다 불어 터지잖아~물도 다 미지근해지고 시원할 때 묵으라고`'
목소릴 높여 신경질적으로 재촉하자
그제서야 목에 두르고 계시던 수건으로 엉덩이에 묻은 흙을 탈탈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얇게 입은 윗옷이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 가득 땀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랑곳 않고
빈그릇에 국수를 담고 주전자의 설탕물을 부어 후룩후룩 정신없이 드신다
아침을 뜨는둥 마는둥 하시더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싶다..
맨 국수가락에 설탕을 탄 물,..그것이 종일토록 땡볕에 앉아 밭을 매야 하는
엄마 식사의 전부였다
괜시리 심통이 나고 목이 메이며 자꾸만 눈물이 쏟아 지려고 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
"엄마! 정금 따고 있을께 다 먹고 나 불러~~'하며 서둘러 정금나무를 찾아 나섰다
"뱀 나올라`깊이 들어가지 말어라`~잉~'
섬이 지겹도록 싫다
파도에 쓸려 나풀거리며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는 파래도 미역도
물기를 머금어 햇살에 반짝이는 조약돌도 전혀 예쁘지 않다
돌맹이에 붙은 하얀 석화를 깨고 달콤하고 짭짜름한 굴을 꺼내 먹느라
왁자지껄 떠들며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슬프게만 보였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슬프고 아픈 것들 뿐이었다
무엇때문이었는지 모든 일을 엄마에게 다 떠 넘기신채 일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시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 중 가장 밉고 또 원망스러웠다
해질녁 어둑어둑한 신작로 길을 터덜거리며 걸어 오시는 엄마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문득 생각해 보니
그토록 많은 농사일에 파묻혀 자신의 삶은 도무지 따로 생각할 겨를도
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시던 그 때의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보다도 어린
젊디 젊은 나이였다
지금의 나라면 그 모진 세월을 그처럼 묵묵히 살아낼 수 있었을까..
엄마에게도 한 여인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꿈도 있었으리라..
지친 몸을 누이고 주무실 때면 의례히 들리던 앓는 소리를
나는 엄마는 원래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
일에 지치고 가슴앓이에 지쳐 만신창이가 된 몸이 아프다는 소리였는데
그것을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밤이면 꼭 그런 소리를 내고 주무시는 줄로만 알았다
가끔은 땀에 절어 시큼한 냄새가 나는 등을 말없이 꼬옥 안아 드리고 싶은데도
괜히 엄마의 눈물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잠들어 있는 동생을 툭 건드리는 것으로 무거운 정적을 벗고 싶었다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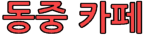








 초등 34회 모임을 이렇게 가졌답니다.
초등 34회 모임을 이렇게 가졌답니다.












모르겠지만 정말고 가슴찡합니다.
얼른봐서 저희동네애기 같기도하고...
아무튼 너무 내용이 좋아서
한곡 올리고 갑니다.
그리고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