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시절 그 즈음 어린날엔 부락이란 단어를 알게 모르게 썼었고, 그당시에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까지도 습관적으로 입에 달라 붙어버리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쓰게 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부락이란 단어는 버린지 오래고, 마을이나 동네로 역부러 쓰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일본어나 일본에서 파생한 단어는 쓰지말아라 한 것보다는 왜 쓰면 안되는지 그 속뜻을 알았으면 합니다.
앞으론 부락이란 단어보다 우리말 고운말 마을이나 동네로 고쳐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락', '법면'은 일본어 잔재
[속보, 연예오락] 2003년 02월 16일 (일) 12:21
일제의 마수로부터 독립이 된 지도 반세기가 넘는 현 시대에 아직도 귀를 의심케하는 일본말이 아무 꺼림낌없이 사용되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아니,일본어라는 의식조차도 모르고 무심결에 사용하는 우리말이 되어버린 것 같다. 차라리 우리말이 되어버린 "외래어"라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어의 잔재를 털어 내지 못하고 외래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니, 아직도 언어의 독립은 요원한 것 같다. 특히 일제가 한국을 멸시하면서 부르던 '부락´이라는 단어를 많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부락´이란 바로 일제가 한국인에게 심어놓은 나쁜 용어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우리말 '마을´이나 촌락´이라 씀이 올바르다.
부락(部落)´이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몇 해 전부터 "군수물자 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특수직업을 가진 마을"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결국 그들이 천민 시 하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백정' '갓바치' '선주(船主)'등이 모여 살던 마을이 당시에는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일본 사회는 그들 부락에 사는 사람들을 취업이나 결혼 시 철저히 배척하고 멸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느 마을에 가도 스스로 '부락민 여러분!...."이라 방송하니, 이 아니 울화통이 터지지 안겠는가? 왜, 스스로 천민집단임을 자칭하는가? 왜, 이러한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가?
고대의 일본은 모음이 우리보다 훨씬 부족했고 단어가 풍부하지 못한 탓에 우리말을 많이 차용했다. 우리의 '마을'에 해당하는 '모라(牟羅-《양서》「신라전」에 '建牟羅'로 나오는 바,'건(建)은 크다는 의미이니 '큰 마을', 즉 '고을'을 의미)를 가져다가 '무라(村)'로 썼으며, 고구려. 백제계 언어인 '고을(郡)'을 가져다가 '코호리'라 사용했다.
일제 때 마을을 '부락'이란 비칭으로 불렀음을 볼 때 얼마나 조선인(한국인)을 멸시했는지 용어 사용에서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앞으로는 사용치 말아야 할 일본어의 잔재이다. 그런데도 이런 용어를 솔선수범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관(官)에서도 무심코 사용하고 있으니,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도로변에 '법면 유실 주의'라든가, 건축사무소의 유리창에 붙은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 하는 "법면 공사자재"란 간판이 눈에 자주 들어온다. '법면'이 무슨 뜻인지 아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니 이 글을 쓰는 한글 소프트도 인식을 못하고 빨간 밑줄이 그어져있다.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도로공사나 건설관련 분야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 용어도 물론 일본어이다. 일본어로 '노리멘(法面)'이라 불린다. 즉, 우리말로 '산비탈'이라는 뜻이다. 좋은 우리말이 있고 '경사면'이라는 한자 식 우리 글도 있다. 그런데도 뜻도 모르는 용어가 왜,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이밖에도 '후까시'라든가 ,'노가다'(정확히는 '도가따'), '함바'(노동자 숙소), '만땅(滿Tank) 등은 물론 야인시대'의 인기를 타고 '오야붕' '꼬붕'이란 말들까지 난무하고 있다.
하루빨리 씻어내야 할 일본어의 잔재이자, 사용치 말아야 할 외래어이다.
정치적으로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어왔으나, 언어의 독립은 아직도 옛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일본어 잔재를 말끔히 씻어 낼 때 진정한 정신적 독립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외래어가 된 일본어라 할지라도 반드시 척결하여 좋은 우리글을 아끼고 사용했으면 한다.
기사제공 : ohmynews
저같은 경우는 부락이란 단어는 버린지 오래고, 마을이나 동네로 역부러 쓰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일본어나 일본에서 파생한 단어는 쓰지말아라 한 것보다는 왜 쓰면 안되는지 그 속뜻을 알았으면 합니다.
앞으론 부락이란 단어보다 우리말 고운말 마을이나 동네로 고쳐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락', '법면'은 일본어 잔재
[속보, 연예오락] 2003년 02월 16일 (일) 12:21
일제의 마수로부터 독립이 된 지도 반세기가 넘는 현 시대에 아직도 귀를 의심케하는 일본말이 아무 꺼림낌없이 사용되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아니,일본어라는 의식조차도 모르고 무심결에 사용하는 우리말이 되어버린 것 같다. 차라리 우리말이 되어버린 "외래어"라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어의 잔재를 털어 내지 못하고 외래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니, 아직도 언어의 독립은 요원한 것 같다. 특히 일제가 한국을 멸시하면서 부르던 '부락´이라는 단어를 많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부락´이란 바로 일제가 한국인에게 심어놓은 나쁜 용어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우리말 '마을´이나 촌락´이라 씀이 올바르다.
부락(部落)´이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몇 해 전부터 "군수물자 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특수직업을 가진 마을"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결국 그들이 천민 시 하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백정' '갓바치' '선주(船主)'등이 모여 살던 마을이 당시에는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일본 사회는 그들 부락에 사는 사람들을 취업이나 결혼 시 철저히 배척하고 멸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느 마을에 가도 스스로 '부락민 여러분!...."이라 방송하니, 이 아니 울화통이 터지지 안겠는가? 왜, 스스로 천민집단임을 자칭하는가? 왜, 이러한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가?
고대의 일본은 모음이 우리보다 훨씬 부족했고 단어가 풍부하지 못한 탓에 우리말을 많이 차용했다. 우리의 '마을'에 해당하는 '모라(牟羅-《양서》「신라전」에 '建牟羅'로 나오는 바,'건(建)은 크다는 의미이니 '큰 마을', 즉 '고을'을 의미)를 가져다가 '무라(村)'로 썼으며, 고구려. 백제계 언어인 '고을(郡)'을 가져다가 '코호리'라 사용했다.
일제 때 마을을 '부락'이란 비칭으로 불렀음을 볼 때 얼마나 조선인(한국인)을 멸시했는지 용어 사용에서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앞으로는 사용치 말아야 할 일본어의 잔재이다. 그런데도 이런 용어를 솔선수범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관(官)에서도 무심코 사용하고 있으니,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도로변에 '법면 유실 주의'라든가, 건축사무소의 유리창에 붙은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 하는 "법면 공사자재"란 간판이 눈에 자주 들어온다. '법면'이 무슨 뜻인지 아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니 이 글을 쓰는 한글 소프트도 인식을 못하고 빨간 밑줄이 그어져있다.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도로공사나 건설관련 분야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 용어도 물론 일본어이다. 일본어로 '노리멘(法面)'이라 불린다. 즉, 우리말로 '산비탈'이라는 뜻이다. 좋은 우리말이 있고 '경사면'이라는 한자 식 우리 글도 있다. 그런데도 뜻도 모르는 용어가 왜,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이밖에도 '후까시'라든가 ,'노가다'(정확히는 '도가따'), '함바'(노동자 숙소), '만땅(滿Tank) 등은 물론 야인시대'의 인기를 타고 '오야붕' '꼬붕'이란 말들까지 난무하고 있다.
하루빨리 씻어내야 할 일본어의 잔재이자, 사용치 말아야 할 외래어이다.
정치적으로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어왔으나, 언어의 독립은 아직도 옛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일본어 잔재를 말끔히 씻어 낼 때 진정한 정신적 독립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외래어가 된 일본어라 할지라도 반드시 척결하여 좋은 우리글을 아끼고 사용했으면 한다.
기사제공 : ohmynews
![[kbs 6시 내고향] 녹동...](http://ggdo.com/zxe/files/thumbnails/949/003/220x120.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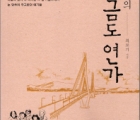
우리마을 참 좋은 동네네.
우리모두 함께 동네 한바뀌 돌아봅시다. 각 마을별로 모여서 새마을 청소도 하고.